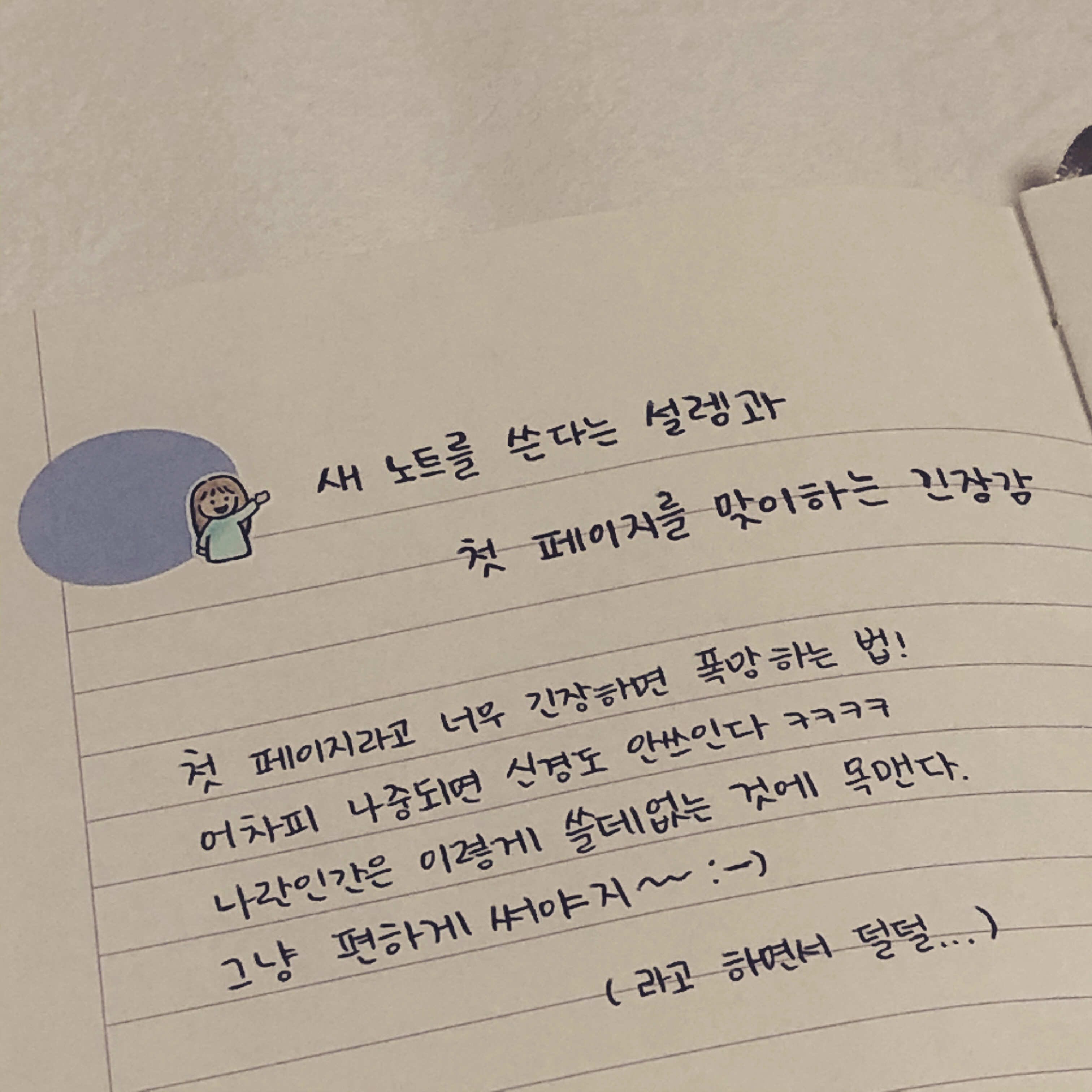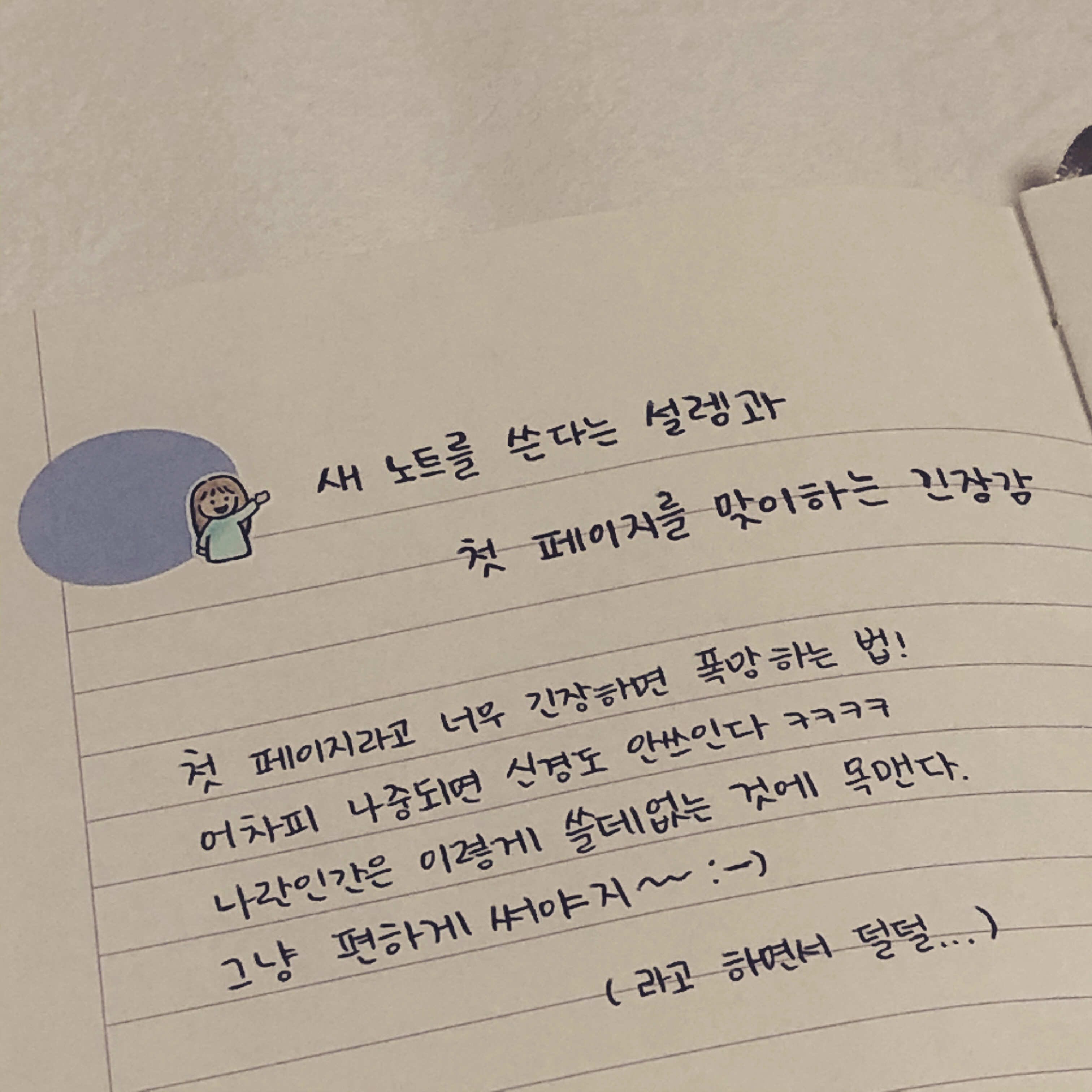독자가 있는 글을 쓴다는 것은 떨린다. 언젠간 에세이집을 낼 수도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살면서도 독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글을 써본 적이 손에 꼽는다. 수치를 많이 끌어안고 살아왔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자라다 보면 내 생각, 감정이 인정되어지는 경험을 많이 못 해보는데 나도 그랬다. 어릴 때 집에 친구가 놀러오면 혹시라도 책장에 꽂혀 있는 일기를 들킬까 봐 친구를 방에다가 혼자 두지 못했다. 너무 들키기 싫은 나머지 친구가 내 일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오기라도 하면 걔가 내 모든 마음을 속속들이 알아버려서 엄청난 수치를 당할거라는 소설을 썼다. 스스로 불안을 창조했다. “일기 볼거잖아!”
“아 어딨는지도 몰라!” 아 창피해. 여러 작가들의 수기를 읽어보면 그들도 이불킥을 많이 한다. 그리고 글을 쓰고있는 순간에도 이불킥 할 것을 예감하기도 하는 것 같다. 그런데도 쓰고, 읽으라고 출판한다. 그래서 서가에 꽂혀있는 많은 작가들이 대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