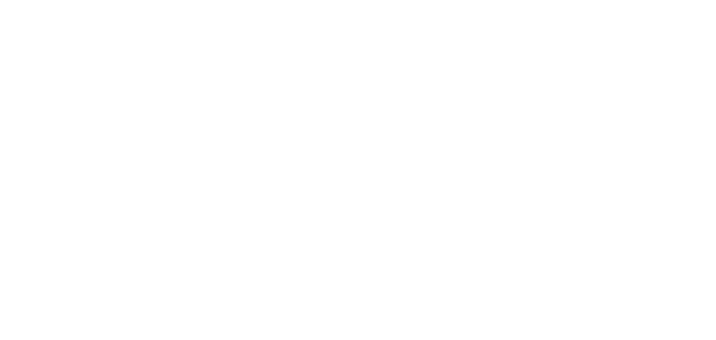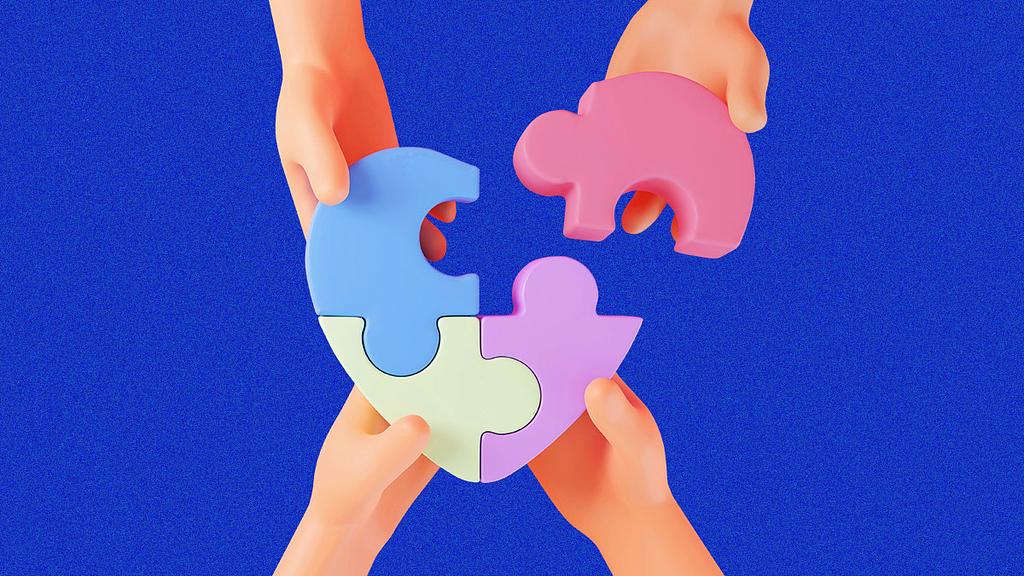조현병 엄마는 행복할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엄마는 아버지의 고향인 대전에서 오빠와 나를 낳고 키우며 예쁜 꽃집을 운영하셨다. 1층엔 꽃집이, 2층엔 엄마, 아버지, 오빠, 나 네 식구가 사는 집이 있었고 꽃집 옆에는 작은 온실이 있었다. 꽃꽂이하는 엄마 옆에서 리본을 수십 개씩 만들었던 기억은 몇 안 되는 엄마와의 추억으로 남아있다.
1997년 외환 위기 직후 우리 집은 거의 파산에 이르렀다. 네 식구가 살던 집과 엄마,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꽃집을 팔고 대전에서 가장 못사는 동네로 이사를 갔다. 오빠와 나의 등하교 시간은 1시간가량 늘어났다. 지난 몇 년간 엄마는 아버지에게 자주 맞았고 우울했으며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돌봄이나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씻고, 먹고, 자는 일상을 유지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아버지는 여덟 남매 중 막둥이였고, 아버지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다. 형제간 사이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엄마는 여섯 자매 중 장녀였다. 엄마의 부모님은 엄마 밑으로 5명의 자녀와 여러 손자녀도 돌보고 계셨다. 혈연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우리 가족은 누구에게 안부를 묻지 않았고 누군가 우리 가족의 안부를 물어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다쳐서 병원비를 내야 할 때나 누구를 때려서 합의금을 물어주어야 할 때는 큰엄마나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학교에 다녀온 어느 날 오후, 엄마가 나를 ‘아줌마’라고 부르며 침대에 소변을 보았을 때도 나는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움을 청할 다른 사람은 떠오르지 않았다.
며칠 만에 우리 집에 오신 외할머니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를 외치며 엄마에게 따귀를 올려붙였다. 그렇게 외할머니를 따라 집을 떠난 엄마는 한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한 달 때쯤 지난 뒤에 엄마를 보러오라고 외할머니에게 전화가 왔고 엄마의 고향인 충남 논산의 어느 한적한 요양원에 엄마를 만나러 갔다. 외할머니는 엄마가 ‘우울하다’고 말했다. 어린 나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외할머니가 시킨 말을 엄마에게 전했다. “엄마, 빨리 나아서 집으로 돌아오세요.” 엄마가 처음 입원한 것은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이다.
‘아픈’ 엄마, ‘이상한’ 엄마
엄마가 퇴원한 이후 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전에서 충남 논산을 오가며 엄마의 ‘빈혈약’을 타왔다. ‘빈혈약’이라는 이름이 어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약 이름이라고 외할머니는 생각하셨던 것 같다. 외할머니는 엄마에게 ‘빈혈약’을 먹이는 것을 신신당부하셨기 때문에 엄마에게 약을 먹이는 것은 내 일상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나는 엄마가 부지런히 약을 먹으면 다시 건강을 회복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엄마는 약 먹기를 거부했다. 엄마는 병식(환자 자신이 병에 걸린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없었고 이상한 약을 먹이는 게 아닌지 의심했다. ‘빈혈약’을 다른 음식에 섞거나 억지로 먹여도 보았지만, 정기적으로 먹이는 것은 어려웠다.
퇴원 후 기력을 회복한 듯 보였던 엄마는 우울해보였고, 세상만사에 둔감했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만성화된 음성증상(negative symptom)이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점차 망상과 환청 등의 양성증상(positive symptom)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어머니에게 더욱 심한 폭력과 통제를 행사했고 엄마의 이상한 모습이 집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쉬쉬했다. 오빠와 나는 엄마의 사랑과 돌봄이 부재하다는 것을 느낄 겨를도 없이 엄마의 말과 행동을 수습해야 했다. 여전히 도움을 청할 곳은 많지 않았다. 도움을 받은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조현병을 마주하다
2007년, 엄마는 충남 논산의 종합병원 정신병동에 두 번째 입원을 했다. 허공을 보며 혼잣말을 하는 등 심한 양성증상을 보였고 밤에 잠들지 못하고 옷을 벗고 동네를 배회하였으며 먹고, 씻고, 잠자는 일상을 전혀 유지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엄마 바로 아래 동생인 서울 이모의 도움을 받아 엄마를 강제입원 시켰다. 엄마 나이 40대 후반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고 병명은 이후 ‘조현병(調絃病,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라는 뜻)’으로 바뀌었다.
병식이 없던 엄마는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정신병동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일주일가량이 지나 처음 전화를 쓸 수 있었던 엄마는 나와 가족에게 욕을 퍼부었다가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빌었다가 잘못했다고 울기를 반복했다. 퇴원하던 날의 엄마는 전보다 차분하였지만, 너무 말라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했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엄마가 입원해 있는 동안 남은 가족들은 ‘따로 또 같이’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군대를 막 제대한 오빠는 대학교 복학을 하지 못하고 쉬는 날 없이 건설현장에서 ‘노가다’를 하며 돈을 모았다. 대학교 4학년이었던 나는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 휴학을 했다. 오빠와 내가 모은 돈은 주로 생활비로 들어갔고 나의 휴학은 2년으로 길어졌다. 이 시기에 나는 수면제를 한 움큼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아버지는 70년대에 수도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배운 사람’이었지만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집과 가게를 팔고 나서 오전에는 지하상가 청소 노동자로, 오후에는 노점상으로 생계를 유지하셨다. 술에 취해 하루를 보내셨고 가족을 돌볼 겨를은 없어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