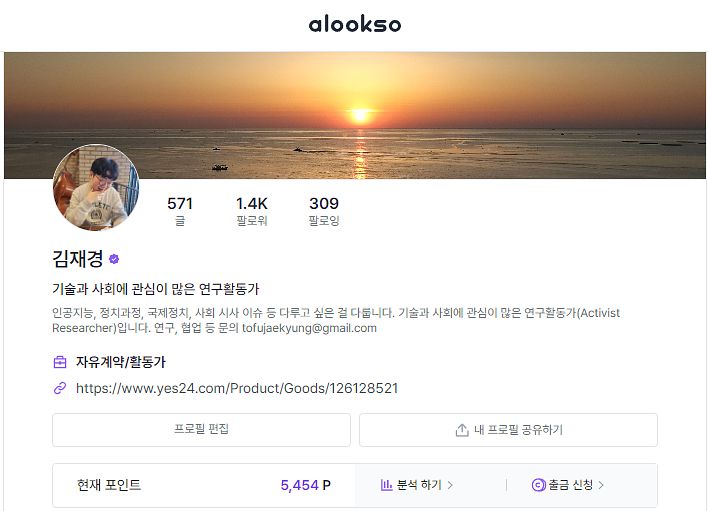얼룩소는 케인지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의미이지만, 분명한 건 나는 공급중시론자다.
이 서비스의 핵심구조를 유지하는 건 결국 '보상'이다. 보상금이 제공되는 구조가 자연스러운가라는 측면을 따질 때는 '돈을 지급하는 주체가 누구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마중물을 넣어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구조가 지속될 수는 없다. 돈을 살포하는 행위는 수요가 극단적으로 없을 때 마중물을 넣어 활로를 뚫어주는 역할인거지,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매칭시켜서 시장이 자가적으로 성장하는 일과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얼룩소는 '글 작성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금을 투여하는' 케인지언이다.
이와 반대로 운영하는 케이스는 유튜브가 대표적이다. 유튜버가 채널을 운영해서 얻는 유료 수익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회사(구글)이 주는게 아니다. 콘텐츠를 잘 만들수록 콘텐츠 중간에 자신들의 광고를 많이 노출해주니, 그걸 원했던 광고주들이 돈을 더 쓰는 거고, 유튜브는 더 많은 광고를 노출한 콘텐츠 생산자에게 광고주의 돈을 전달한 것 뿐이다. 즉, 수요자와 공급자의 매칭을 도와줬을 뿐이다. 너무 자연스럽고, 근본적으로 재생산이 가능한 구조다. 구글이 보상금을 줘서, 고퀄의 글작성 수요를 유인한 게 아니다.
이처럼 수요, 공급이 만나는 게 아니라 '운영주체'가 자금을 직접 살포하면 결국, 보상금을 주는 기준이 첫번째 관건이 된다. '보상금 제공 주체'가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게 가장 빠르게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응을 측정해서 보상을 준다는 개념을 얼룩소가 언급한 점은 다행스럽다. 근데 소비자 반응 측정하는 거, 콘텐츠 랭킹화 로직 만들어 본 입...
이 서비스의 핵심구조를 유지하는 건 결국 '보상'이다. 보상금이 제공되는 구조가 자연스러운가라는 측면을 따질 때는 '돈을 지급하는 주체가 누구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마중물을 넣어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구조가 지속될 수는 없다. 돈을 살포하는 행위는 수요가 극단적으로 없을 때 마중물을 넣어 활로를 뚫어주는 역할인거지,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매칭시켜서 시장이 자가적으로 성장하는 일과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얼룩소는 '글 작성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금을 투여하는' 케인지언이다.
이와 반대로 운영하는 케이스는 유튜브가 대표적이다. 유튜버가 채널을 운영해서 얻는 유료 수익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회사(구글)이 주는게 아니다. 콘텐츠를 잘 만들수록 콘텐츠 중간에 자신들의 광고를 많이 노출해주니, 그걸 원했던 광고주들이 돈을 더 쓰는 거고, 유튜브는 더 많은 광고를 노출한 콘텐츠 생산자에게 광고주의 돈을 전달한 것 뿐이다. 즉, 수요자와 공급자의 매칭을 도와줬을 뿐이다. 너무 자연스럽고, 근본적으로 재생산이 가능한 구조다. 구글이 보상금을 줘서, 고퀄의 글작성 수요를 유인한 게 아니다.
이처럼 수요, 공급이 만나는 게 아니라 '운영주체'가 자금을 직접 살포하면 결국, 보상금을 주는 기준이 첫번째 관건이 된다. '보상금 제공 주체'가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게 가장 빠르게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응을 측정해서 보상을 준다는 개념을 얼룩소가 언급한 점은 다행스럽다. 근데 소비자 반응 측정하는 거, 콘텐츠 랭킹화 로직 만들어 본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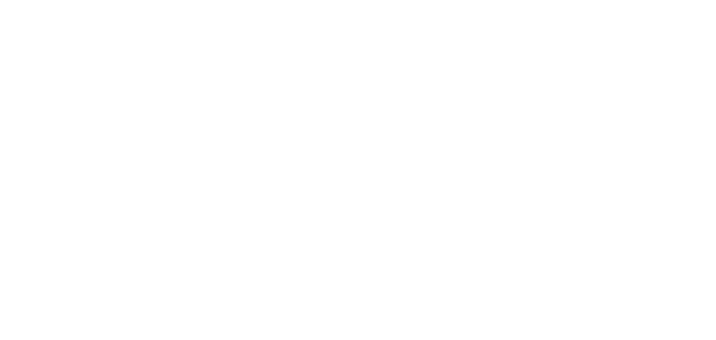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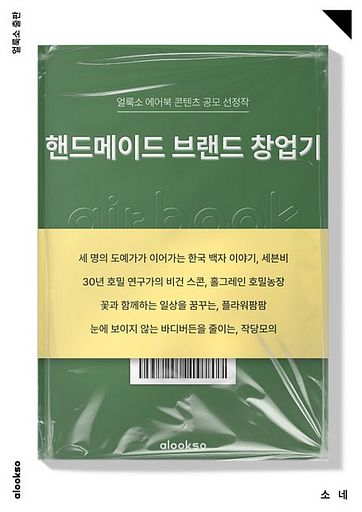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