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3만 명 소도시에 영화관이 없다고?
2024/03/05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2003년은 처음 지하철을 탔던 해이다. 외할머니가 당시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어서 명절 때마다 가족과 함께 지방에서 올라갔었다. 오랜만에 보는 많은 친척들은 어린 나와 사촌들에게 용돈을 많이 주곤 했다. 용돈을 두둑이 챙긴 나와 사촌들은 지하철을 타고 롯데월드에 가기 위해 집 근처 1호선 회기역으로 향했다. 사촌 중에 서울에 사는 이도 있었지만, 나처럼 지방에서 사는 사람도 있었다.
약속한 것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나를 비롯한 사촌 몇몇은 알록달록한 지하철 노선도와 미로 같이 복잡한 출입구에 경악했고, 마치 해외여행을 처음 하는 것처럼 승차권을 어떻게 사는지 허둥지둥 대던 모습이 내 머릿속에 숏폼처럼 또렷이 재생된다. 승차권을 투입구에 어떻게 넣는지 모르고 그 출입구에 테트라포드처럼 생겨 밀면서 들어가야 하는 장애물이 너무 거대해 보였다. 먼저 게이트를 통과한 다른 사촌들은 그런 나를 보고 놀려대기도 했다.
지방 소도시에 사는 나에게 서울은 그런 도시였다. 없는 게 없는 도시. 볼 것도 많고 사람도 많고 또 할 것도 많은 곳. 중학생이 되자 친하게 지내던 친구 중에 한두 명이 서울로 전학을 가기도 했다. 매년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외할머니댁에 방문했으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질투도 커져만 갔다. 전학 간 친구들은 하나같이 자랑을 해댔기 때문이다.
특히 나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내가 살던 소도시에서는 보고 싶은 영화를 개봉하는 날짜에 볼 수 없었다. 개봉한다는 날짜에 맞춰 영화관에 가도 상영시간표에서 보이지 않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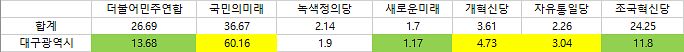




영화관이 없다니 돈아까워서 그러는가 아님 모지 세상에 이럴수가
어느 지방에는 이와 반대로 인구가 적어도 만들어주는 것을 보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제 지인은 울릉도 출신은 영화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영화관이 없었던 모양 돈 아까워 하더군요 영화보는 것도 감수성 넘칠 때 경험하지 않으면 즐기는 맛이 다른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