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로서 사회보험료 부담의 의무를 지니고, 베짱이로서 실업급여의 권리를 누린다.
2023/07/17
○ 노동시민 간 연대가 곧 고용보험을 탄생시켰다.
자본주의 초기 유럽의 노동조합들은 노동시간 단축 요구와 더불어 실업보험을 주목했다. 당시 고용안전망이 부재한 현실에서 한 번의 실직은 노동자 개인이나 가족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공포였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조합 결성 후 조합원들에게 일정 기금을 모아 자체적 상호부조를 통한 실업보험 사업을 운영했다. 한 마디로 실업보험 기금의 운용 및 활성화는 노동조합의 중요한 정체성이었다는 뜻이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실업보험이 노동조합 내부를 넘어 공적제도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 출발은 벨기에 겐트지역이었는데, 정부가 실업보험 기금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한 것이다. 겐트 시스템의 주요한 특징으로 기금의 가입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에만 국한되지 않음으로써, 일자리를 잃은 더 많은 시민에게 실업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었다. 겐트시스템 모델은 20세기 초반 북, 서유럽 전반에 널리 퍼지며 제도화를 이룬다. 나아가 1차 세계대전 이후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며 기존 임의가입 방식으론 대응이 어렵게 되어, 여러 국가가 강제가입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자본주의는 빠르게 고도화를 이루면서도 대공황 및 석유파동 등 예측하기 어려웠던 경제위기를 통해 실업의 일상화를 불러일으킨다. 이에 70년대 이후엔 실업급여 제공을 넘어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서비스, 보험료 납부 여력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실업부조 지급 등 적극적 고용노동정책으로 진화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보험’이다. 노동자들 간 상호부조가 시작이었고,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였으며, 지금까지도 노동시민 간 연대에 기반 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제도이다.
○ 점진적 발전, 동시에 숙제를 떠안고 있는 한국의 고용보험 제도
한국의 경우 1993년 12월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1995년부터 본격 시행이 되었다. 도입 최초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도입이 되었다. 그러나 97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외환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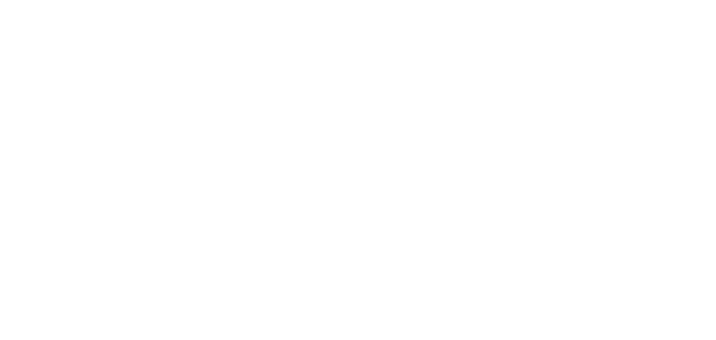
- 5기 청년유니온 위원장(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자 위원(전)
- 7기 청년유니온 대외협력팀장(현)
- 비관에 빠져있는 상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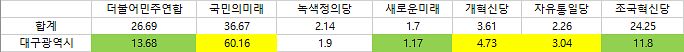





비판하기는 쉽고 구조 개선은 하나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우니 비판만 하는 것이겠지요.
민주주의가 그런 약점을 보완해주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능이 영 비리비리 하네요.
공감하며 잘 읽었습니다. 시의적절한 글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