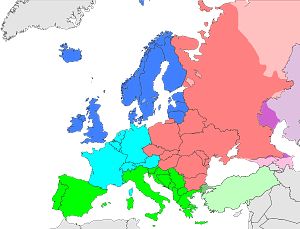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넌 커밍아웃 했어?
아니, 죽을 때까지 벽장에 있을 거야.
정체성을 두고 비슷한 고민을 하던 또래 친구들과 종종 나누던 대화. 열에 아홉은 도리질을 쳤다. 무슨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냐는 식으로. 스물에 하나쯤은 커밍아웃이든 아웃팅이든 둘 중 하나를 경험했다고 했다. 그중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린 네가 어떤 사람이든 널 사랑해. 네가 자랑스럽구나." 와 같은 멘트 따위를 들어본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신 가출, 절연, 잠적 등의 다소 극단적으로 느껴지는 결과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난 시나리오투성이였다.
나는 어떠했던가?
나는 오바를 조금 보태서 걸어 다니는 커밍아웃이었다.
가족부터 시작하는 건 당연했다. 왜? 내 유토피아적 관점으로는 가족이야말로 누구보다 먼저 이런 나의 고민을 알고 이해해주고 지지해주어야 하는 존재였으니까.
가족 나들이 중이었다.
스무 살의 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