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자의 전성시대 – 식모와 여공에서 버스걸과 창녀까지
2022/12/02
호스티스 영화의 범람
1970년대 한국 영화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호스티스’ 물의 범람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아 생소할 수도 있는 단어 ‘호스티스(Hostess)’는 손님을 시중들거나 접대하는 여성을 일컫는 말이다. 7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원뜻에서 변형돼 술집에서 일하거나 윤락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였다. 프랑스어 ‘마담(madame)’이나 우리말 ‘아가씨’처럼 원래 의미보다 특정한 뉘앙스를 연상시키는 맥락으로 사용되다 보니, 일상에서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이 됐다.
이상스럽게도 1970년대 한국 영화에서는 가난한 여성, 못 배운 여성, 가정과 일터에서 고통 받는 여성들에 대한 재현이 주를 이뤘다. 하층계급 여성의 수난사 혹은 사회적 지위의 차이 때문에 이뤄질 수 없었던 여성의 실패한 사랑 이야기가 관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영화 속 여성 주인공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안간힘을 쓰고 잘 살아보려 했으나, 이들은 하나같이 모진 삶을 살다가 끝내 남자에게 버림받고 자살하거나 병을 얻어 죽고 만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대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어린 여자인 경우가 많았다. 저학력 비숙련의 젊은 여성들이 도시에서 처음 구한 직업은 식모 혹은 버스 차장 같은 것이었다. 물론 여공이 돼 공장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다. 대부분 열악한 처우를 받는 일자리였지만 이런 기회라도 빨리 얻으려면 뒷돈을 쓰거나 월급 몇 개월 치를 받지 않는 조건을 내걸지 않으면 안됐다.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농촌에서 쏟아져 나와 서울과 인천 등지로 계속 몰려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돈을 적게 줘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넘쳐나던 시절이었다.
이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세상살이의 혹독함을 일찌감치 깨닫는다. 아등바등 살아보려 몸부림치지만 나아지는 게 별로 없다. 빚에 허덕이다 나쁜 사람들의 꾐에 빠져 몸을 버리거나, 다방이나 술집으로 팔려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몸 주고 마음 줬던”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받는 일도 흔했다. 그 와중에 일터에서 사고를 당해 불구가 되거나, 시련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치병에 걸려 객사하는 결말도 낯설지 않다.
호스티스 영화는 가혹한 세상사에 치여 점차 몰락하게 되는 여성이 잠시 거쳐 가는 특정 직업에만 주목해 이름을 붙인 장르 구분법이나 마찬가지다. 1970년대 유행한 호스티스 영화란 실상 ‘하층계급 여성들이 경험했던 보편적인 수난서사’이자 ‘여성이 사회적으로 고립돼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좌절서사’라 보는 편이 더 타당하겠다.
그렇다면 당대 호스티스 영화를 제작했던 수많은 남성 작가와 영화감독들은 어떤 이유로 여성의 수난과 고통을 표나게 강조한 것일까? 1970년대 남성 지식인들은 왜 그렇게 여성의 정신과 신체를 편집증적으로 훼손하려했던 것일까? 가난하고 못 배운 여성이 남성에게 구원받을 뻔하다가 끝내 버림받는 장면을 통해 당시 관객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던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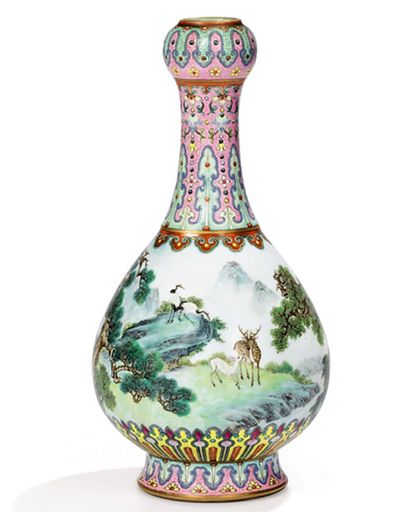




초기 연기의 그런 무대식 확장은 몰입하기 좀 힘들었다.또는 사람은 원래 시끄러운데, 특히 도시화가 막 시작된 시기입니다.아니면 이런 모습은 하늘나라의 정경을 반영해 이야기 자체가 오히려 덜 중요할 수도 있다.
마지막엔 다들 좋은 결말을 맺었다.영자 자신으로선 창수와 결혼했다면 평생 죄책감을 느낄 거고, 차라리 절름발이를 따라오는 게 편할 거야.그래서 좋은 결말이다.모든 신데렐라는 결국 구두 수선공을 찾았습니다.모두 매우 기뻐하다.
현실은 조금 더 아쉬움이 남지만 어쩔 수 없다.
소위 서브컬처 B급의 서사에 녹아든 사회적 신체성에 주목한 글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저자의 시선이 기대됩니다^^*!
한국 b급 무비의 어떤 계보의 시작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 시대의 아픔이 후대에 이르러서는 완전 다른 의미로 희화화 될 수도 있다는 현실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아픔과 슬픔 또한 나중의 누군가에게는 혹은 다른 곳의 누군가에게는 한낱 웃음거리가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잊혀질 수도 있었던 그때의 영자를 다시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글입니다! 처음부터 완전 흡입해서 보았네요.
정조를 지켜야 하는 여성.. 그런데 정조를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물리적인 폭력으로 제시.. 모든 여자는 남자에게 깨끗한 성녀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욱더 섬뜩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산'의 임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되는 삶이,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한국사회가 정의한 '정상'적인 삶...
마지막에 정리해주신 것처럼 [‘성장’과 ‘발전’만을 앞세우며 그토록 야만적이고 잔혹했던 1970년대] 라는 말이 맘 속에 와닿았습니다.
반세기가 지났을 뿐인데, 세상은 너무나 달라졌네요. 제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남한의 근대 역사에 부인할 수 없는 여성성 변화와 자유주의…선민의식으로 바라보는 기득권의 시각도 있지만 결국 허위겠지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한 시대의 아픔이 후대에 이르러서는 완전 다른 의미로 희화화 될 수도 있다는 현실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아픔과 슬픔 또한 나중의 누군가에게는 혹은 다른 곳의 누군가에게는 한낱 웃음거리가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잊혀질 수도 있었던 그때의 영자를 다시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글입니다! 처음부터 완전 흡입해서 보았네요.
정조를 지켜야 하는 여성.. 그런데 정조를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물리적인 폭력으로 제시.. 모든 여자는 남자에게 깨끗한 성녀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욱더 섬뜩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산'의 임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되는 삶이,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한국사회가 정의한 '정상'적인 삶...
마지막에 정리해주신 것처럼 [‘성장’과 ‘발전’만을 앞세우며 그토록 야만적이고 잔혹했던 1970년대] 라는 말이 맘 속에 와닿았습니다.
반세기가 지났을 뿐인데, 세상은 너무나 달라졌네요. 제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남한의 근대 역사에 부인할 수 없는 여성성 변화와 자유주의…선민의식으로 바라보는 기득권의 시각도 있지만 결국 허위겠지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소위 서브컬처 B급의 서사에 녹아든 사회적 신체성에 주목한 글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저자의 시선이 기대됩니다^^*!
한국 b급 무비의 어떤 계보의 시작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초기 연기의 그런 무대식 확장은 몰입하기 좀 힘들었다.또는 사람은 원래 시끄러운데, 특히 도시화가 막 시작된 시기입니다.아니면 이런 모습은 하늘나라의 정경을 반영해 이야기 자체가 오히려 덜 중요할 수도 있다.
마지막엔 다들 좋은 결말을 맺었다.영자 자신으로선 창수와 결혼했다면 평생 죄책감을 느낄 거고, 차라리 절름발이를 따라오는 게 편할 거야.그래서 좋은 결말이다.모든 신데렐라는 결국 구두 수선공을 찾았습니다.모두 매우 기뻐하다.
현실은 조금 더 아쉬움이 남지만 어쩔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