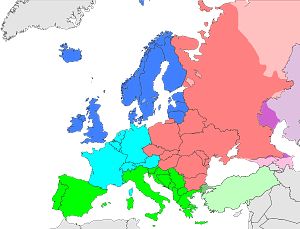엄마도 청년이다
2024/03/12
“엄마가 되는 건 어때?” 이런 질문을 받을 때의 속마음은 이렇다. 목구멍에 찹쌀떡이 쑥 밀어 들어온 것처럼 목이 막힌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의 잠재력’이라는 키워드로 콘텐츠를 만드는 당사자라면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 반짝이는 상대의 두 눈에서 엄마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읽는다.
지극히 지난한 현실의 다큐와 아이가 주는 기쁨과 삶에 대한 환희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무얼 먼저 전해야 할까. 마음속으로 저울질한다. 그래봤자 조삼모사. ‘가족 같은’이라는 키워드에서 부모 책임론이라는 한국 특유의 가족 중심주의가 대두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건 개인의 이기적인 선택이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담론에 '요즘 애들‘이 문제라는 시대착오적 화법을 대입할 수 있겠는가. 문제의 ’요즘 애들‘은 물질적으론 풍요로웠으나 정서적으로는 각박하게 살아왔다. 끝없는 경쟁과 비교에 시달리며 성장한 이들은 결과론 중심의 강박에 여전히 고통받는 중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난리지만 애석하게도 지역은 관심 밖의 영역이다. 병원과 전문의 부족으로 갑자기 밤에 아이가 열이 끓기라도 하면 인근 광역시의 대형 병원으로 엑셀을 밟아야 한다. 다자녀 가정을 흔하게 목격하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분만 가능한 병원은 단 세 곳. 한순간에 응급으로 넘어가는 분만의 특성상 전문의 감소는 산모와 아이라는 2인분의 목숨과 직결된다. 산부인과 수가는 턱없이 낮은데 분만실을 유지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법이다.
읍면동으로 들어가면 다문화로 불리는 아이들의 비율이 높아진다. 갈수록 부모의 국적이 한국인 경우가 소수가 되다 보니 한국 아이들이 역차별당한다는 보도가 화제를 모았다. 이 지점에서 뒤집어 생각해 보자. 우리가 다문화라 부르던 이들을 어떻게 대해 왔는가. 차별과 무지를 넘어 무신경하지 않았던가.
사라지는 학생 수에 대비해 일찍이 지역의 여러 전문대에서는 신입생 모집에 만학도를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섰다. 어차피 돌...

엄마의 잠재력에 주목하는 [포포포 매거진]을 시작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에세이 그림책 [레터스 투 라이브러리], 인터뷰집 [내 일을 지키고 싶은 엄마를 위한 안내서] 등 세상이 부여한 어떤 역할보다 개인이 가진 고유성과 주체성을 조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