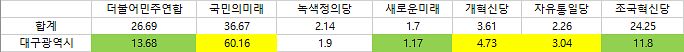무운을 모른다 고백하셨던 분께 드리는 글.
최근 <무운> 해프닝을 보고 '와 저걸 모르나? 근데 찾아보지도 않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에디터께서 쓰신 글을 읽고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기억나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니 좀 어이없고 화나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무운의 뜻을 아는 사람은 (내 주변에) 별로 없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과하게 비난을 받는 것 같다"
"마감에 쫓기다 보면 찾아보지 못하고 급하게 썼을 수 있다" (사실 이 지점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치부에 꽤 오래 머물러 있는 편입니다. 정치는 타 부서에 비하면 비교적 유행어/신조어와 거리가 멀고, 좀 더 정제된 언어, 혹은 옛스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사 제목에 유행어/신조어가 쓰이면 신기해합미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꺼내고, 모르는 게 보이면 찾으면 되니까요.
물론 정치인은 국민에 대고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좀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고,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정치부를 하다보면 고맥락 언어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죠. 까다로운 것은 맞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를 해석하고, 배경을 설명하는 일을 하니까요. 그러나 이번 해프닝을 지켜보며 기자들이 요구하는 "쉬운 언어"의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지성 역시 대단한 것이 아니기에, 동료들의 지식이 일천하다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의 대처입니다.
기자라면 "저 사람의 말은 어렵다 쉽게 말해달라", "그런 말 요새 누가 쓰느냐", "나 말고도 내 주변에 다 모르더라"고 하기 전에, 그 단어를 찾아볼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이 해프닝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