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의 사고방식]1. 보수적 발상-귀납의 한계와 전화위복: 천왕성 궤도의 비밀
2023/10/25
과학은 가장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학문이라는 심상이 강하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느끼는 사정은 좀 복잡하다. 과학이 가장 혁명적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과학의 보수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혁명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 과학자들은 아무리 기상천외한 현상이 발견되더라도 일단 기존의 체계(패러다임) 속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자들은 대단히 보수적이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본다는 점에서 기존 체계에 대한 집착이 병적이다 싶을 정도이다. 이렇게까지 구체제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그 모든 시도가 실패했을 때 아무런 미련 없이 혁명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마음이 돌아서면 과학자들은 누구보다도 열렬한 혁명의 전도사로 돌변한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과정은 제아무리 혁명적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인 혁명이나 사회적인 변혁과는 다른 점이 있다. 정치사회적인 혁명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뜻하지만 과학에서의 혁명은 단절이라기보다 확장에 가깝다. 여기서 과학자들의 보수성이 갖는 역할이 존재한다. 기존 체제로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그 경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새로운 체제와의 연결점 또는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과학의 보수성은 과학의 혁명성과 동전의 양면이다. 과학은 가장 보수적이기 때문에 가장 혁명적일 수 있고, 그래서 단절이 아닌 연속과 확장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이것이 내 생각에는 과학이 가장 성공적인 학문으로 아직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다.
사실 정치사회적인 혁명도 구질서(앙시앵레짐)의 모순을 누구나 체감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과학에서는 더욱 그렇다. 뭔가가 얼마나 새로운지, 얼마나 혁신적인지를 잘 알려면 일단 기존체계부터 잘 알아야 한다. 혁명의 출발은 앙시앵레짐부터 잘 아는 것이다. 보통 비과학 또는 사이비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통과학을 잘 모르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나도 지금까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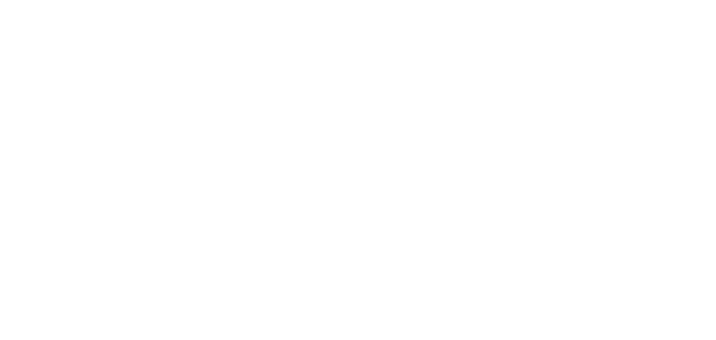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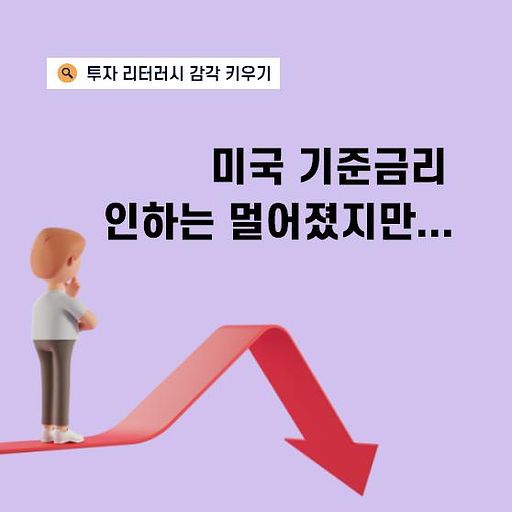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