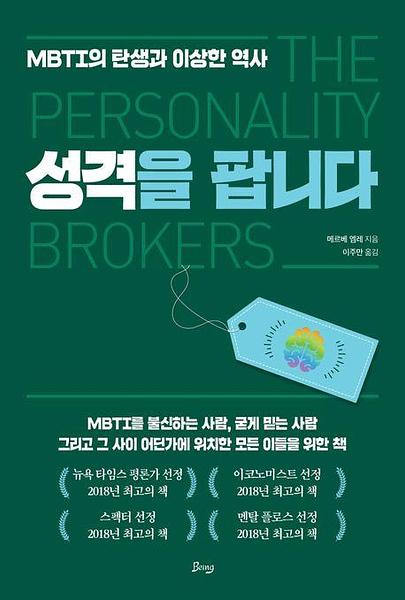불안은 심리검사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2023/06/02
초등학생인 둘째가 화장실에 가더니 혼잣말을 한다. 두루마리 휴지의 방향이 평소와 다르다는 거다. 바깥쪽에서 당겨야 하는데 반대로 끼워져 있으니 불편하다면서 투덜거린다. 화장실에선 휴지가 있냐 없냐만 고민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 하니 대화를 듣던 중학생 첫째가 끼어든다. 휴지의 방향에 따라 사람 성격이 다른데, 동생의 경우 어쩌고 저쩌고 특성이란다. 의아해하자 진짜 그런 거 있다면서 스마트폰을 들고 설명한다.
그런 시대다. 탕수육 소스를 부어먹는 사람과(부먹파) 소스에 찍어먹는 사람의(찍먹파) 특징 등의 분석이 얼마나 많은가. 떠먹는 요구르트 뚜껑에 묻은 걸 먹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를 논하고, 무인도에 갈 때 들고 갈 물건에 따라 신중하네, 즉흥적이네 등 괴상한 해석이 등장한다. 별의별 ‘그저 재밌자고 하는 소리’가 넘쳐난다. 문제는, ‘재밌자고’에서 안 근친다는 거다. 그런데 유행이 되면 되돌리기가 힘들다. 비과학성을 짚은들, “맞을 수도 있죠”라는 식의 반론이 등장한다.
초등학생들도 자신의 성격을 체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자신의 성격을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로 구분된 가로줄 어디에서 적당히 찾아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확인을 과거보다 빨리하는 셈이다. 이 정도까진 괜찮다. 하지만 이런 토대 위에서 수업시간에도 MBTI가 활용된다. 학생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뭉치게 하면 집단 간의 차이가 더 선명하게 보이면서 순간 수업이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일단 진단 자체가 전문적이지 않다. (한국일보 칼럼에서 이를 짚은 바 있다. 아래 참조)
불안은 심리검사의 원인일까? 결과일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심리검사를 한다는 분석이 많다. 불안하니 자신을 알고 싶다는 식이다. 틀린 접근은 아니지만, 정교하지 않다. 사는 게 팍팍해서 불안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왜 심리검사에 집착하는 걸까? 여기에는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 불안은 심리검사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그게 다시 원인이 되어 나와 너의 심리를 알고 싶어 한다. 심리검사를 하는 원인은, 심리검사 때문이다.
심리검사는 기업에서 활용되면서 규모가 커졌다. 직원 복지가 아니라 비용을 절감해 이윤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직무에 적합한 유형을 찾고 과하게 칭찬을 하면 자연스레 그 반대의 유형도 도드라진다. 어제까지 하나의 성격에 불과한 게 하루아침에 ‘고쳐야 하는 결함’으로 규정된다. 있는 그대로를 확인하는 수위를 넘어서 자신을 적합과 정상의 기준에서 판단하게 하는 식이니 ‘검사할수록’ 스스로를 부족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불안의 덩어리도 커진다.
이 불안은 ‘~하는 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성격이 성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낙오된 들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다. 그러니 빠른 방법을 간절히 찾는다. 회사 생활 잘하는 성격이 궁금해지고 동료와 잘 지내는 ‘구체적인’ 법을 알아야 한다. 이 정서가 사회 전체에 퍼지면 별의별 ‘법’들이 난무한다. 연애하는 법을 묻는 콘텐츠는 얼마나 많아졌는가. 살면서 느껴가는 소소한 이치들이지만, 연애 ‘안’ 하는 걸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회에선 마음이 조급해진다. 공부 잘하는 법은 ‘초등학생 아이가 특목고로 가는 법’이라면서 구체화된다. 그 안에 학원 정보만 있겠는가. 아이든 부모든 이런저런 성격이라면 명문대는 꿈도 꾸지 말라는 채찍질이 난무한다.
끊임없이 자신이 괜찮은지, 적절한 지를 반복적으로 물어야 하는 시대에는 심리검사는 일상이 된다. 관계 맺음이 ‘서툰’ 세대가 심리검사에 더 몰두한다고도 하지만 틀린 말이다. ‘서툰 관계 맺음’을 인정해주지 않는, 기다려주지 않는 현실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이들은 불안한 거고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또 검사를 한다.
사람의 심리를 알면 특정한 상황에 적응하도록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의 해법이 적응만은 아닐 거다. 때론 싸우고 논쟁해야 변화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다고 하자.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하면 가부장적 문화가 빠질 수가 없다. 헌신적인 어머니를 다루면 성별 고정관념이 반드시 등장한다. 이기적인 전문직 종사자를 엘리트교육의 폐해를 빼고 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유형들은 심리검사 안에서는 어떤 유형 하나에 불과해져 개인의 무례함이 E000, I000 등의 알파벳 네 글자에 덮어지는 경우가 많다. 방송에서도 게스트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면서 자기는 MBTI가 무엇이라 별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 이처럼 심리검사가 과잉되면 비상식도 성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