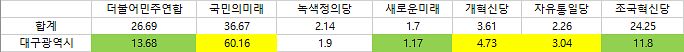[고전에 무릎 꿇다 7] ‘신의 딸’에게 사랑받았던 남자의 일생 - 『장성택의 길』
2024/0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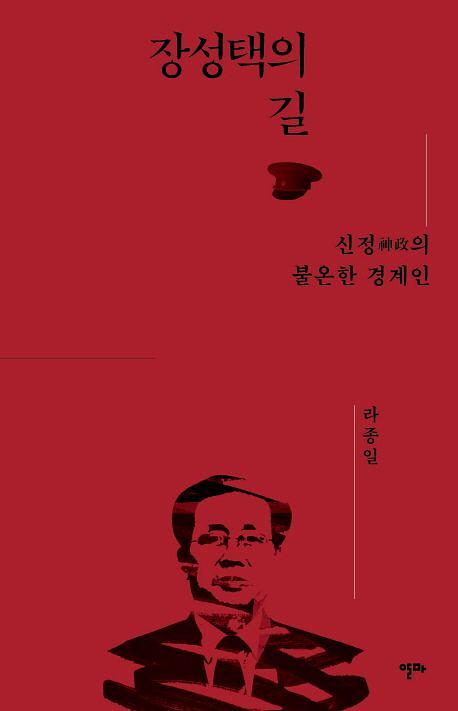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던 20대의 일이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에게 휩싸여 지내던 어느 날, 이런 질문이 날아왔다. “넌 노스 코리아에서 왔니?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니?” 들어본 적이 없던 질문에 당황했던 나는 “여기에 온 거 보면 모르겠어? 당연히 사우스에서 왔지!” 라고 퉁명스레 대꾸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치기어린 자존심 때문이었으리라. 내가 북한에서 온 걸로 보인다고? 국민들이 굶든 말든 제 영달만 추구하는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온 걸로 보인다고?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하고,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데 자부심을 가졌던, 철없고 편협했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 뒤로도 자주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 “노스 코리아 사람들하고 만나본 적이 있느냐? 노스 코리아에 가본 적이 있느냐? 혹시 그곳에 남아 있는 친인척이 있느냐?” 호기심으로 점철된 질문들에 응수하면서 나는 알았다. 내부에 있는 이들은 북한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으며 살아가지만 외부인들은 ‘한국인’을 늘 북한과 묶어서 생각한다는 걸. 외부인들에게 코리안은 노스 코리안이나 사우스 코리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걸.
숨겨 놓았던 언니나 동생을 만난 느낌이었다. 나와 피를 나눈 동기 간이 이 세상 어디엔가 있었고, 나를 제외한 모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시종일관 내가 그 동기간과 비교 당해왔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알게 된 듯한 느낌. 반공 교육을 받으며 자란 1970년대생에게, 반공 포스터 그리기 대회에서 적대감이 넘쳐나는 그림을 그려 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우물 안 영혼에게, 북한이 실은 대한민국과 동기간이며, 대한민국을 이루는 많은 부분이 북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은 적잖은 충격이었다. 그 전에도 물론 교과서를 통해 북한이 우리의 주적임과 동시에 동기간이라는 개념을 마르고 닳도록 배웠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그다지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다.
내 머...

2013년 장편소설 『모던하트』로 제18회 한겨레문학상을 수상하며 작가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 『잠실동 사람들』, 『맨얼굴의 사랑』, 『그 남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에세이 『엄마의 독서』, 『당신이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 『높은 자존감의 사랑법』, 『이렇게 작가가 되었습니다』, 논픽션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