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대 기원의 새로운 조망과 방법론적 한계
2023/07/13

한국 인문학계를 통틀어서 ‘근대성’이라는 화두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이다. 그중 한국 문학계의 근대 문학연구는 근대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통해 ‘언어’와 ‘민족’, ‘민족문학’, ‘문학’을 내파하는 과정이었다. 거의 10여년을 풍미한 한국 문학계의 근대성 연구는 긍정의 의미든 부정의 의미든 간에 ‘역사의 종언’이나 ‘근대 문학의 종언’이라는 세계사적 , 문학적 전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이념 내지 사상적 차원에서 근대(근대문학)의 기원에 접근한 연구의 경향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학문적 경화 상태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방식의 연구 틀과 다른 시선을 요구하게 되었다.
근대성의 존재조건과 방식의 차원이 문제가 되는 지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국 문학계는 좀 더 진일보한 연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황호덕의 연구는 그 누구의 것과도 다른 방식을 제시하고 있었고 수많은 자료 제시의 현란함 때문에 자못 충격을 안겨 주기까지 했다. 이전까지 근대 네이션과 언어의 역학적 의미를 다루고 있는 논의가 시기적으로 일제 식민지 시대나 멀리 나아가도 1900년대 초기에 머무르고 있다면 황호덕의 책은 그 시기를 그 이전(개항시기에서 갑오경장 직후(1876~95년))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일단 이목을 끈다.
근대 형성의 시기를 이전 연구들보다 좀 더 앞당겨 본 셈이다. 임형택이 자국어형성의 문제를 다룬 연구에서 “언문일치의 자각과 함께 실제로 부상한 것은 국문체가 아닌 국한문체였다”는 엄연한 역사적 현실을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면 황호덕은 『근대 네이션과 그 표상들』을 통해 이를 좀 더 심화 발전시키고 있다. ‘언어’와 ‘네이션’, ‘에크리튀르’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근대 형성기의 외교 공문서, 기행기, 각종 매체의 ‘언어’...
근대 형성의 시기를 이전 연구들보다 좀 더 앞당겨 본 셈이다. 임형택이 자국어형성의 문제를 다룬 연구에서 “언문일치의 자각과 함께 실제로 부상한 것은 국문체가 아닌 국한문체였다”는 엄연한 역사적 현실을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면 황호덕은 『근대 네이션과 그 표상들』을 통해 이를 좀 더 심화 발전시키고 있다. ‘언어’와 ‘네이션’, ‘에크리튀르’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근대 형성기의 외교 공문서, 기행기, 각종 매체의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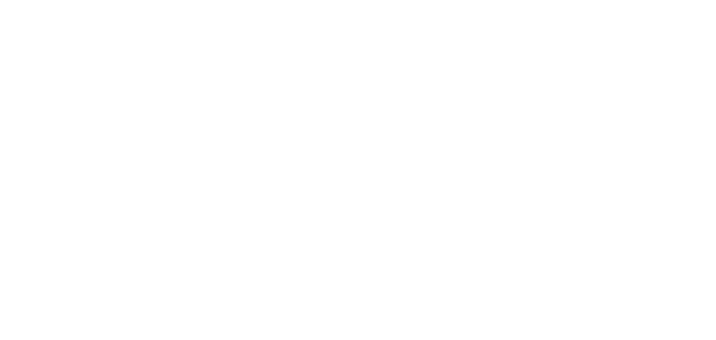



















@story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재밌는 글 올려보겠습니다.^^
글을 읽다보니
무게감이 제법 느껴졌습니다.
ㅎㅎ
저만 그런가 했더니...
아래 댓글 읽어보니 다들 같은 느낌이었네요.
그래도 강부원님 덕분에~
그냥 덮어버릴법한 글도 되새김질하듯~
찬찬히 읽어내려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자꾸 쉬운글만 읽으려고 하는
글 편식이 생기네요.
덕분에 고함양영양분
제대로 섭취하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청자몽 아카이빙 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글 올리면 저도 안 볼 것 같아요. ㅎㅎㅎ 재미없죠.
딸 아이(예비 초등생) 한글 가르치느라 도움이 될만한 여러가지를 찾아보는 중에, '학습 도구어'라는걸 따로 챙겨야함을 알게 됐어요. 평소에 사용하는 말이 아닌, 학문적으로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 익혀야하는 단어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 말고,
우리가 학술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글도 읽고 해석할 수 있게 연습을 해야 하나봅니다.
....
근대 문학의 기원을 넓힐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하다보니, 아무래도 책에 나온 중세어는 아니고, 근대언어 당시 언어 혹은 단어로 설명을 하게 되어
그냥 읽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뭔가 이런 학문적 접근한 글도 접해버릇 해야할거 같아요.
....
쉽고 편한 것이 더 좋으니, 자꾸 더 편해지려는 속성이 아무래도 있을듯 해서
평소에 '잘 안 읽히는/ 잘 안 넘어가는' 책과
요즘 교육관련 책(이건 제가 공부해야하는거라 ㅠ 아이 가르치려면, 아니고 제가 아이를 잘 따라가려면 반드시 읽어야할)을
일부러 읽으려고 합니다. 안 넘어가는 책은 몇줄 읽는데도 어렵긴 하더라구요;;
유치원딸 덕분에 그림책은 매일 읽게 되구요 ^^. 그림책 좋아요. 재밌어요. 그런데 그림책도 너무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분량 배분해서 빌려오고 있어요.
....
어렵고, 쉽고, 흥미롭고, 놓치지 말아야하고 등등..
여러가지들을 접할 수 있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글도 잘 보고 갑니다 : )
작가님이 여러가지 다양한 분야를 소개해주셔서, 글을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반복 이전에 올린 제 글들은 소일거리로 재밌게 읽은만한 글도 제법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대에 맞는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
아 그렇지요? 좀 어려운거 맞지요?ㅎㅎㅎ
답변을 주심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ㅎ
훨씬 가까워진 기분이 듭니다
다음 번에는 재미있는 글도 한 번쯤 부탁드려요~ ㅎㅎㅎ
@반복 네. 쉽게 읽을 수 있는 글들도 올리고, 어려운 글도 올리고 합니다. 특별히 관심 갖지 않으면 재미없거나, 읽는 것 자체가 고단하기도 할 겁니다. 좀 쉽게 쓰면 좋았으련만 , 원텍스트가 어려워서 제 글도 좀 난해하게 됐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클레이 곽 네. 좀 읽을만한게 써야 하는데, 재주가 부족합니다. 직업적으로 쓴 글이라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솔직히 너무 어려워서..한번 읽어서는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몇번을 읽어봐야 할지...엄청난 내공을 갈아 부어서 쓰신글임을 알기에 한자 한자 다시 읽어보려합니다. 다시 천천히 읽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여기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의 지식의 저변을 넓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반복 이전에 올린 제 글들은 소일거리로 재밌게 읽은만한 글도 제법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대에 맞는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
아 그렇지요? 좀 어려운거 맞지요?ㅎㅎㅎ
답변을 주심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ㅎ
훨씬 가까워진 기분이 듭니다
다음 번에는 재미있는 글도 한 번쯤 부탁드려요~ ㅎㅎㅎ
@반복 네. 쉽게 읽을 수 있는 글들도 올리고, 어려운 글도 올리고 합니다. 특별히 관심 갖지 않으면 재미없거나, 읽는 것 자체가 고단하기도 할 겁니다. 좀 쉽게 쓰면 좋았으련만 , 원텍스트가 어려워서 제 글도 좀 난해하게 됐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클레이 곽 네. 좀 읽을만한게 써야 하는데, 재주가 부족합니다. 직업적으로 쓴 글이라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솔직히 너무 어려워서..한번 읽어서는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몇번을 읽어봐야 할지...엄청난 내공을 갈아 부어서 쓰신글임을 알기에 한자 한자 다시 읽어보려합니다. 다시 천천히 읽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여기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의 지식의 저변을 넓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story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재밌는 글 올려보겠습니다.^^
글을 읽다보니
무게감이 제법 느껴졌습니다.
ㅎㅎ
저만 그런가 했더니...
아래 댓글 읽어보니 다들 같은 느낌이었네요.
그래도 강부원님 덕분에~
그냥 덮어버릴법한 글도 되새김질하듯~
찬찬히 읽어내려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자꾸 쉬운글만 읽으려고 하는
글 편식이 생기네요.
덕분에 고함양영양분
제대로 섭취하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청자몽 아카이빙 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글 올리면 저도 안 볼 것 같아요. ㅎㅎㅎ 재미없죠.
딸 아이(예비 초등생) 한글 가르치느라 도움이 될만한 여러가지를 찾아보는 중에, '학습 도구어'라는걸 따로 챙겨야함을 알게 됐어요. 평소에 사용하는 말이 아닌, 학문적으로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 익혀야하는 단어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 말고,
우리가 학술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글도 읽고 해석할 수 있게 연습을 해야 하나봅니다.
....
근대 문학의 기원을 넓힐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하다보니, 아무래도 책에 나온 중세어는 아니고, 근대언어 당시 언어 혹은 단어로 설명을 하게 되어
그냥 읽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뭔가 이런 학문적 접근한 글도 접해버릇 해야할거 같아요.
....
쉽고 편한 것이 더 좋으니, 자꾸 더 편해지려는 속성이 아무래도 있을듯 해서
평소에 '잘 안 읽히는/ 잘 안 넘어가는' 책과
요즘 교육관련 책(이건 제가 공부해야하는거라 ㅠ 아이 가르치려면, 아니고 제가 아이를 잘 따라가려면 반드시 읽어야할)을
일부러 읽으려고 합니다. 안 넘어가는 책은 몇줄 읽는데도 어렵긴 하더라구요;;
유치원딸 덕분에 그림책은 매일 읽게 되구요 ^^. 그림책 좋아요. 재밌어요. 그런데 그림책도 너무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분량 배분해서 빌려오고 있어요.
....
어렵고, 쉽고, 흥미롭고, 놓치지 말아야하고 등등..
여러가지들을 접할 수 있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글도 잘 보고 갑니다 : )
작가님이 여러가지 다양한 분야를 소개해주셔서, 글을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