찻잔 속 담론들의 시대
2023/04/24
[편의상 음슴체로 쓰겠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되고 몇 달 지난 어느 순간부터, 사회 담론들을 보며 뭔지 모를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공허함을 느낀 건 담론이 틀려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을 당 대표로 뽑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 이태원 사고에 있어서 윤석열과 이상민의 책임을 논한 글을 보자. 분명히 맞는 말이었고 사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적이 많다.
내가 공허함을 느낀 건 담론에서 더 이상 옛날같은 보편성과 아우라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언론이고 시민단체고 정당이고 많이들 인용하고 호응이 좋은 담론이 하나는 있었다.
고전적인 반공 보수 담론,
윤석열이 당선되고 몇 달 지난 어느 순간부터, 사회 담론들을 보며 뭔지 모를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공허함을 느낀 건 담론이 틀려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을 당 대표로 뽑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 이태원 사고에 있어서 윤석열과 이상민의 책임을 논한 글을 보자. 분명히 맞는 말이었고 사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적이 많다.
내가 공허함을 느낀 건 담론에서 더 이상 옛날같은 보편성과 아우라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언론이고 시민단체고 정당이고 많이들 인용하고 호응이 좋은 담론이 하나는 있었다.
고전적인 반공 보수 담론,
민주당과 구좌파 진보정당을 대표하는 진보 담론(https://alook.so/posts/o7trxMy 참고),
유승민 이준석 등을 필두로 한 합리적 보수 담론,
2010년대 중반 이후 유행한 페미니즘 및 소수자 인권운동에 따른 신좌파 담론 등등.
시대에 따라 달랐지만 한국 사회는 어느 시대든 네 담론 중 최소 하나는 유행했다.
어떤 담론이든 과도하게 나이브했거나 틀린 주장도 분명 있었고 그래서 쇠퇴하기도 했지만,
담론들은 한때나마 사회를 지배했으며, 밝은 미래를 꿈꾸는 포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담론들 어디에서도 나는 시대를 개혁하는 힘을 느끼지 못한다.
과거에 하던 소리들을 맥 없이 녹음기처럼 반복하거나,
주장들이 보편성을 잃고 과격해져서 중도로의 확장성을 눈 뜨고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과거의 보편적인 큰 꿈을 잃고 악받이에 가까운 주장만 남는다.
이들 담론이 현실이 되더라...
2010년대 중반 이후 유행한 페미니즘 및 소수자 인권운동에 따른 신좌파 담론 등등.
시대에 따라 달랐지만 한국 사회는 어느 시대든 네 담론 중 최소 하나는 유행했다.
어떤 담론이든 과도하게 나이브했거나 틀린 주장도 분명 있었고 그래서 쇠퇴하기도 했지만,
담론들은 한때나마 사회를 지배했으며, 밝은 미래를 꿈꾸는 포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담론들 어디에서도 나는 시대를 개혁하는 힘을 느끼지 못한다.
과거에 하던 소리들을 맥 없이 녹음기처럼 반복하거나,
주장들이 보편성을 잃고 과격해져서 중도로의 확장성을 눈 뜨고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과거의 보편적인 큰 꿈을 잃고 악받이에 가까운 주장만 남는다.
이들 담론이 현실이 되더라...

중요한 주제와 관점을 거론하려는 박사과정생.
의견은 다를지라도 대화하면서 많은 걸 배우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갖고 싶습니다. 이메일: ybk0423@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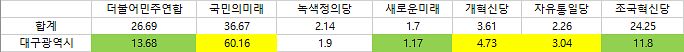





@김영빈 개인적으로는 trust 개념을 제 논문에 종속변인으로 측정해 봤던 입장인데요, 정말 가장 뜬구름 잡는 사회과학적 개념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신뢰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의 '신뢰' 인가?" 저조차도 텅 빈 방에서 허우적거리는 기분이었는데 평범한 응답자들은 더더욱 자기 소견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실제로 측정 문항들의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각주를 달아 부연설명을 했을 정도입니다.)
제 요지는 '함께 걷고 있던 옆 사람이 갑자기 넘어졌을 때,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일으키는' 덕목이 사라졌다는 의미에서의 각자도생이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이 사라진 사람들, 공동체성이 붕괴된 사람들, 옆에서 누가 죽어도 신경 안 쓰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담고자 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와 기관에 대한 신뢰가 증가 추세라는 것은, "내가 어차피 신경 안 써도 나랏님이 알아서 할 텐데 뭐" 하면서 계속 자기 생존에만 골몰하는 세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유영진 음... 각자도생이 '담론 없는 시대'의 한 축일 수는 있는데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모든 사회적 자본이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대인에 대한 신뢰는 줄어든 대신 기관에 대한 신뢰가 꽤나 증가했습니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이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고.
설령 각자도생이 시대정신이라고 해도, 2020년대 한국 복지국가 수준은 결코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와 결코 같지 않기 때문에 각자도생의 의미가 과거와 같을 수 없습니다. 복지국가화와 증세의 급속한 진전으로 "이만하면 됐으니 더 이상 국가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마인드가 생겨났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각자도생 담론이라는 게 있다면 아마 그것이 오늘날의 담론일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목숨 하나 건사하는 삶이면 그걸로 됐다는 생각을 '담론' 이라는 거창한 용어로 부를 수 있다면요. 옆에서 뒤에서 남들이 아무리 엎어지고 자빠지고 고꾸라져도, 나만큼은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살얼음판 위를 조심조심 걷는 사람처럼 그런 거 신경쓸 겨를 없이 당장 내 생존만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남녀노소 모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회 없는 사람들' 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도 기억나네요.
https://alook.so/posts/PvtB0MG
@김영빈 개인적으로는 trust 개념을 제 논문에 종속변인으로 측정해 봤던 입장인데요, 정말 가장 뜬구름 잡는 사회과학적 개념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신뢰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의 '신뢰' 인가?" 저조차도 텅 빈 방에서 허우적거리는 기분이었는데 평범한 응답자들은 더더욱 자기 소견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실제로 측정 문항들의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각주를 달아 부연설명을 했을 정도입니다.)
제 요지는 '함께 걷고 있던 옆 사람이 갑자기 넘어졌을 때,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일으키는' 덕목이 사라졌다는 의미에서의 각자도생이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이 사라진 사람들, 공동체성이 붕괴된 사람들, 옆에서 누가 죽어도 신경 안 쓰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담고자 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와 기관에 대한 신뢰가 증가 추세라는 것은, "내가 어차피 신경 안 써도 나랏님이 알아서 할 텐데 뭐" 하면서 계속 자기 생존에만 골몰하는 세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유영진 음... 각자도생이 '담론 없는 시대'의 한 축일 수는 있는데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모든 사회적 자본이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대인에 대한 신뢰는 줄어든 대신 기관에 대한 신뢰가 꽤나 증가했습니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이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고.
설령 각자도생이 시대정신이라고 해도, 2020년대 한국 복지국가 수준은 결코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와 결코 같지 않기 때문에 각자도생의 의미가 과거와 같을 수 없습니다. 복지국가화와 증세의 급속한 진전으로 "이만하면 됐으니 더 이상 국가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마인드가 생겨났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각자도생 담론이라는 게 있다면 아마 그것이 오늘날의 담론일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목숨 하나 건사하는 삶이면 그걸로 됐다는 생각을 '담론' 이라는 거창한 용어로 부를 수 있다면요. 옆에서 뒤에서 남들이 아무리 엎어지고 자빠지고 고꾸라져도, 나만큼은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살얼음판 위를 조심조심 걷는 사람처럼 그런 거 신경쓸 겨를 없이 당장 내 생존만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남녀노소 모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회 없는 사람들' 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도 기억나네요.
https://alook.so/posts/PvtB0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