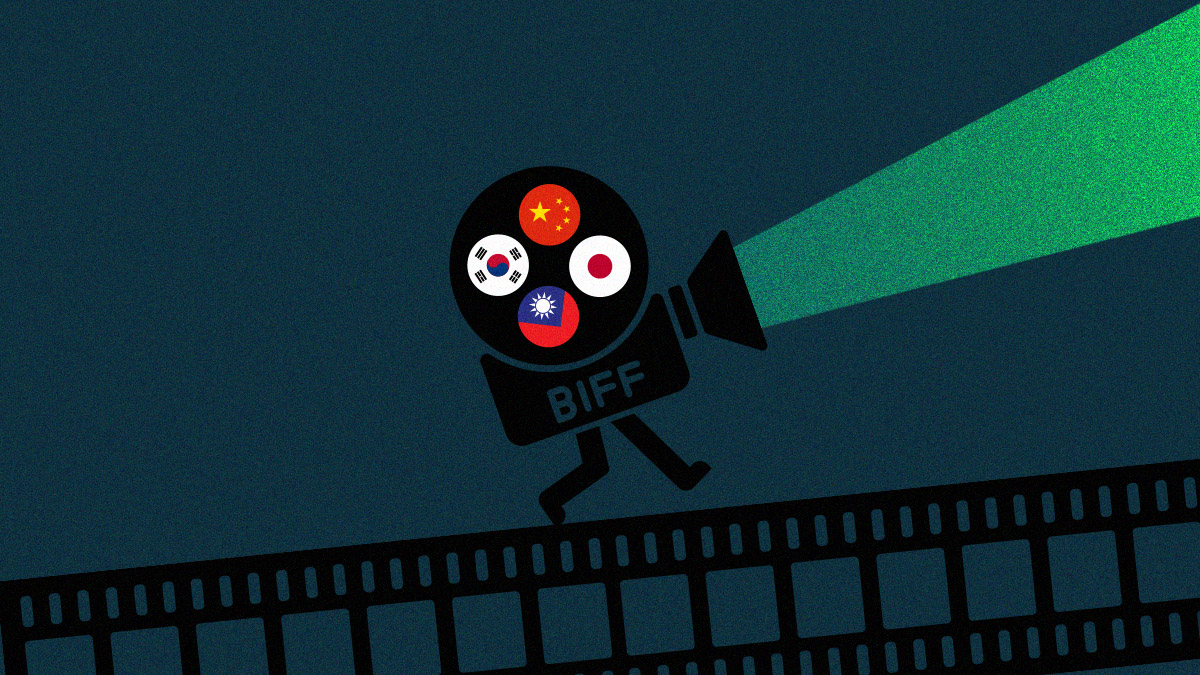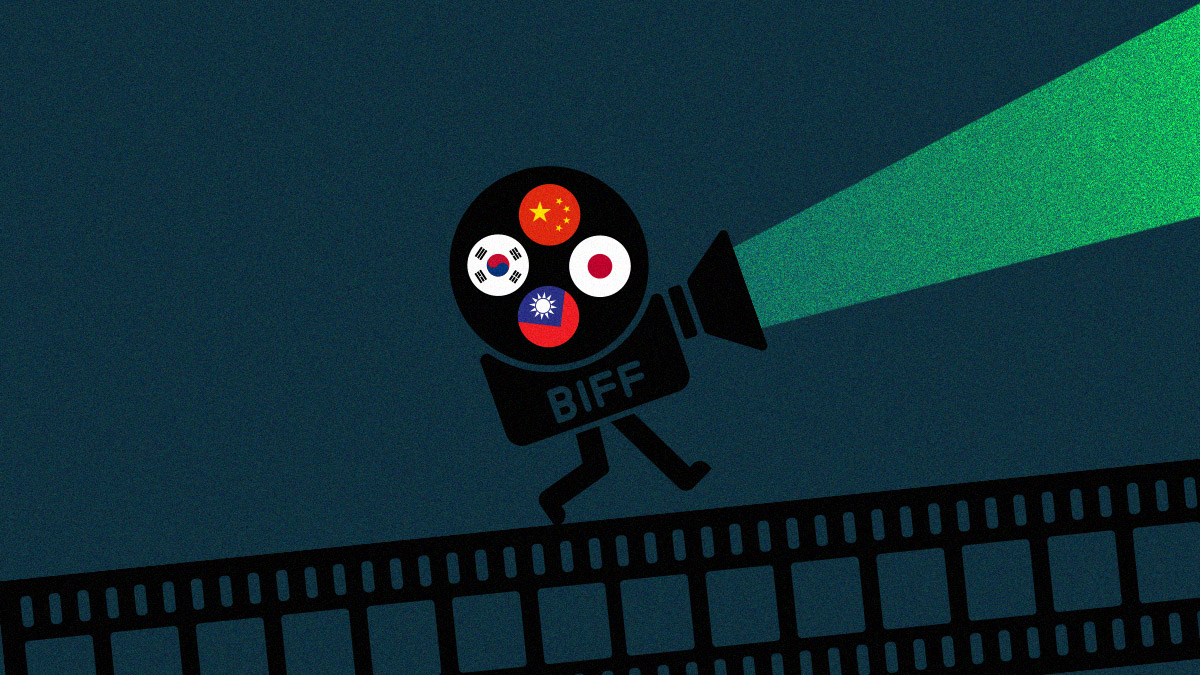
라이뷰
부산국제영화제, 숨어 있는 뒷이야기
한국 영화제가 마주한 딜레마
2022/10/31
에디터 노트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성장한 부산국제영화제.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민거리가 많다. 자기 입맛에 맞게 운영하려는 정치권의 외압, 지역을 위한 축제로 변모하라는 언론과 주민의 요구. 어떻게 중심을 잡고 방향성을 다져야 할까? 20년 이상 영화 기자로 일한 필자가 거침없이 자신의 견해를 펼친다.

이제 세계 3대 영화제는 없다. 지나치게 단호하다고? 하지만 일단은 단호하게 단정 지으며 이 글을 시작해야겠다. 오랫동안 칸, 베니스, 베를린 국제영화제는 세계 3대 영화제로 불렸다. 각각의 특징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 1932년 시작된 베니스 영화제는 베니스 비엔날레 부속 행사로 출발한 만큼 영화의 예술성에 집중한다. 1946년 베니스와 경쟁하기 위해 만들어진 칸 영화제는 역시 예술영화의 성전이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 시장 덕분에 영화 비즈니스의 성전이기도 하다. 1951년 출발한 베를린 영화제는 그 도시의 성격이 그렇듯이 영화의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에 좀 더 귀 기울이는 편이다. 거의 반세기 동안 세 영화제는 서로의 영역을 크게 침범하지 않고 국제영화제로서의 모범 답안을 써 내려왔다.
그런 시대는 끝났다. 지난 10여 년 사이 베니스와 베를린은 영향력을 크게 잃어버렸다. 대신 칸 영화제가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예술영화로 출세를 바라는 영화인이라면 최종 목표에 베니스와 베를린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것이 예술영화 시장의 축소와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 예술영화 시장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보라.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홍상수 같은 예술영화 감독이 상당한 제작비로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 제57회 칸 영화제에서 <올드보이>와 함께 경쟁 부문에 오른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는 제작비가 15억 원이 넘었고 CJ엔터테인먼트가 배급을 맡았다. 이제 홍상수는 1억 원 미만의 제작비로 아주 작은 규모의 영화를 만든다. 그게 지금 한국에서 가장 독창적인 예술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씨네21> 기자, 남성지 <GEEK> 디렉터,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편집장을 거쳤다. <한겨레신문>, <에스콰이어>, <조선일보> 등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