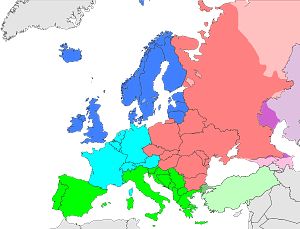[소설] 풋잠 6회 – 개인과 공동체
“그럼 지금 바로 집에 가실 분?”
“없네요!”
바대표가 말을 마치기 무섭게 이호랑이 없다고 말을 했다. 나는 사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계속 있을지는 정하지 못했다. 준병이 형과 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싶었지만, 준병이 형은 이곳에 계속 머무르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그럼 잠깐 화장실 갈 사람 갔다 오고, 10분간 휴식을 한 후에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좋습니다!”
바대표가 휴식을 제안하자, 준병이 형이 옳다구나 하고 바로 받았다. 잠시 후 2~3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때를 맞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영화관 건물 바깥으로 향했다. 그러면서 전화를 받는 척했다. 그리고 잠시 걸었다. 마셨던 술이 좀 깨는 것 같았다.
경미한 수준의 뇌성마비가 있었던 나는 몸의 근육들이 뻣뻣하다. 그래서 어릴 때는 학교에서 항상 우스운 취급을 당하고 괴롭힘의 대상만 되었다. 진정한 교분을 나눌 대상으로 여겨진 건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나 가능했다. 어릴 적부터 친구 사귀지를 못한 나에게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건 후천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하는 일이었다. 그렇기에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나면 언제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두통이 오곤 했다.
영화관 바로 앞에는 중랑천이 있었다. 중랑천의 벤치에 앉아서 강이 흐르는 것을 잠시 보았다. 준병이 형한테서 전화가 왔다.
“경헌아, 집으로 갔니?”
“아뇨. 잠시 걸으러 나왔어요. 요즘 너무 누워있었더니, 한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게 힘드네. 헤헤”
“어여 들어와. 다들 너 기다리고 있으니까.”
왜 나를 기다린다는 거지, 싶었다. 계단을 올라 다시 풋잠으로 향했다. 영화관이 있는 2층에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람들이 단체로 웃는 소리를 들으면 쓸쓸해지곤 했다. 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