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될 수 있는 얼굴들에 대해
2023/04/14
봄비가 온다. 봄비. 두 글자만으로 설렐 수 있다니. 언어는 때로 마법 같다. 빗소리와 서정적인 음악소리가 어우러지는 틈을 비집고 새소리가 날아든다. 비를 맞으면서도 재잘거리는 새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 나는 늘 이야기가 궁금하다. 한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 한 사람의 생각에 관한 이야기, 한 시대가 혹은 한 지역이 겪어온 이야기. 글 쓰는 삶을 살고 싶다 생각했을 때부터였을까. 글은 맥락이니, 사람을 볼 때도 맥락이 궁금했다. 이 사람은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끊임없이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나날이다. 열 살 무렵 귀신이나 유령이 제일 무서웠던 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제일 무섭다. 한밤중 갑자기 골목길에서 튀어나오는 낯선 사람도 공포지만, 알던 사람을 더는 모를 것만 같은 순간에도 두려움은 몰려온다.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머릿속에 그려보곤 한다. 웬만하면 백지로 놔두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는 한 사람을 내 안에서 창조하고 만다. 그 사람이 내뱉은 단어들, 알게 된 사연들, 갖가지 표정과 제스처들까지 모든 건 한 사람을 빚는 재료로 쓰인다. 조각이 많을수록 더 구체적인 사람이 된다.
그럼에도 어렵기만 한 게 사람이다. 완전한 모습으로 결코 그려낼 수 없는 게 사람이고. 타인에게 나도 그렇게 어려운 존재일까. 만나자마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단순한 사람이 좋을 때도 있지만, 만날수록 깊이가 더해지는 사람에게 신뢰가 갈 때도 있다. 일관된 사람이 낫지 싶다가도, 날씨 같은 감정을 지닌 사람이 어떻게 일관될 수 있을까 하는 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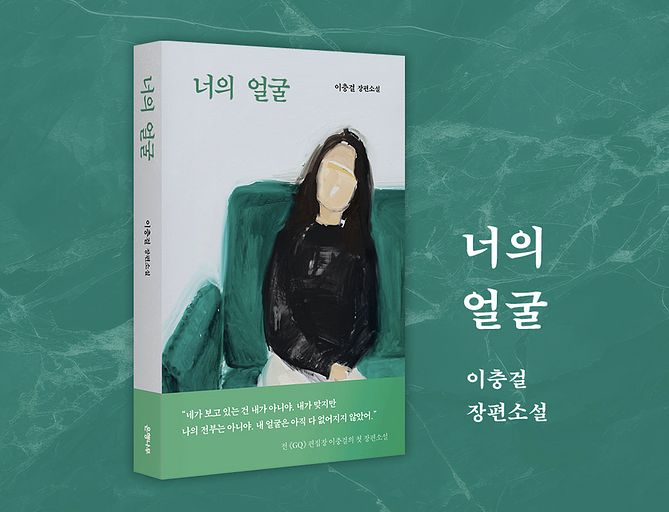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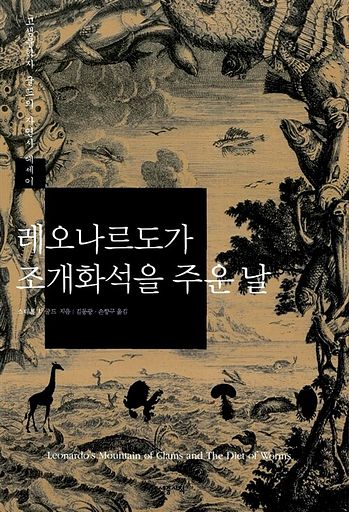

노란꽃을 보면 너무나도 이뻐서 그저 미소가 지어져요 ~~!!
@샤니맘 꽃이 자주 핀다는데… 제가 좀 더 키워보고 귀띔해드릴게요. 저도 아직 초짜라;;
@박현안 @콩사탕나무 어흑!!...글읽으며 나두 한번 키워볼까 했는데..두분 다 죽인 경험이 있다고 그러시니 겁부터 납니다. 차라리 다른사람손에서 크는게 나을듯요.ㅎ
@콩사탕나무 저도 사실 십 년 전쯤 하나 죽인 적이… 제주에서 분명 잘 자란다 했는데 ㅜㅜ 그 이후로 엄두를 못 내다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와서 얼떨결에 저리 큰 나무로 키웠네요. 제가 키웠다기보다 지가 자란;; 만발하면 인증샷 올릴게요!! 넘 기대하고 있어요. ㅎㅎ
애니시다가 제주에서는 월동을 하는군요?
애니시다 화분을 두어 개 죽인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아이더라고요. ^^;;
와!! 작은 화분이 저정도로 풍성하게 자라다니요??
나중에 노란 꽃을 피워낸 사진도 올려주세요^^
땅의 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꽃을 피운 대견한 애니시다와 검은 돌담, 젖은 땅까지 제주의 봄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
애니시다가 제주에서는 월동을 하는군요?
애니시다 화분을 두어 개 죽인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아이더라고요. ^^;;
와!! 작은 화분이 저정도로 풍성하게 자라다니요??
나중에 노란 꽃을 피워낸 사진도 올려주세요^^
땅의 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꽃을 피운 대견한 애니시다와 검은 돌담, 젖은 땅까지 제주의 봄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
@콩사탕나무 저도 사실 십 년 전쯤 하나 죽인 적이… 제주에서 분명 잘 자란다 했는데 ㅜㅜ 그 이후로 엄두를 못 내다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와서 얼떨결에 저리 큰 나무로 키웠네요. 제가 키웠다기보다 지가 자란;; 만발하면 인증샷 올릴게요!! 넘 기대하고 있어요. ㅎㅎ
@박현안 @콩사탕나무 어흑!!...글읽으며 나두 한번 키워볼까 했는데..두분 다 죽인 경험이 있다고 그러시니 겁부터 납니다. 차라리 다른사람손에서 크는게 나을듯요.ㅎ
노란꽃을 보면 너무나도 이뻐서 그저 미소가 지어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