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제 삶입니다> : 섭식장애와 함께한 15년
2024/02/17

열두 평 남짓한 투룸에서 밤 10시가 넘도록 혼자 집을 지켜야 했던 어린 시절, 나는 울적하고 막막한 기분을 식욕으로 달랬다. 맵고 달고 짠 분식으로 끼니를 때웠고, 빵,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주전부리를 입에 달고 살았다. 침잠된 분노가 불시에 나를 집어삼킬 때면, 야식으로 라면 세 개를 끓여 찬밥까지 말아 먹어야 직성이 풀렸다. 갓 지은 밥과 국, 나물 반찬과 생선구이가 차려진 건강한 밥상은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했다. 영양 따윈 내팽개친 채, 입맛 당기는 대로 음식을 해치웠으니 체중이 불어나는 건 당연지사였다. 뒤룩뒤룩 살찐 몸을 혐오하면서도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았다. 식탁에 앉으면 어김없이 나를 한계로 몰아붙였다. 배가 불러도 음식을 집요하게 씹어 먹었고, 배가 쿡쿡 쑤실 만큼 아파도 우악스럽게 입속으로 잔반을 욱여넣었다. 그때는 몰랐다. 폭식은 자해의 또 다른 이름이었음을.
오직 무절제한 식탁 위에서만 자유를 누렸다. 식사 시간에는 조심해야 할 것도, 삶을 통제하는 규율도 없었다. 음식에 중독되어 자제력을 잃게 되자 폭식은 습관이 되었다. 자기 학대를 일삼으면서 살아 있음을 느꼈고, 고통이 커질수록 더 큰자극을 갈망했다. 방바닥을 뒹굴고 기어다니며 진이 다 빠질 때까지 울어 젖힌 후에는, 꼭 냉장고를 털었다. 눈에 보이는음식을 모조리 꺼내서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먹었다. 위가 팽창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소화기관이 점점 망가졌다. 한 달에 두세 번은 체해서 소화제를 마셨고, 두 달에 한 번씩 구토를 했다. 많이 먹는 것은 그렇다 쳐도 구토 증세는 빈도에 상관없이 절대 들켜선 안 될 비밀이었다. 거식이라면 모를까, 폭식 후 속을 게워내는 짓을 하다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차갑고 날선 시선들을 상상하자, 온몸에 칼이 꽂힌 것처럼 살갗이 따갑고 쓰렸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 사회에서 몸무게는 정상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자 자기 관리의 척도다. 몸이 곧 나였고, 내가 곧 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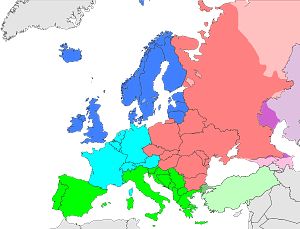



섭식장애 -또다른 시각으로 보게되는 책이네요!
👍우리딸 모습을 본듯한 책과글~~^&^
저도 승아 님 글만큼은 꼭꼭 씹어삼킵니다..
섭식장애 -또다른 시각으로 보게되는 책이네요!
👍우리딸 모습을 본듯한 책과글~~^&^
저도 승아 님 글만큼은 꼭꼭 씹어삼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