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쓰기(1) : “우리는 왜 그토록 아픈 계절을 지난 후에야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2023/09/05

만 11세~13세, 인간이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면 두 얼굴을 갖는 일에 능숙해진다. 나라고 다를까. 빈한한 자존감을 자의식과잉으로 덮으려 했고,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 10%의 나를 100%로 확장했던 때가 있었다. 매일 주어진 하루를 꽉꽉 채우며, 홀로 고통과 시름하던 어린 날, 나는 "항상 웃고 있어서 보기 좋다.", "밝고 재미있다."라는 말속에 은신처를 마련하곤 했다. 지나고 보니 얼룩덜룩한 상처뿐인데, 그 시절엔 알록달록한 일상이라고 자기 암시를 걸었다. 이제 최면에서 깨어나 아픔의 바다에 잠겨 익사할 뻔한 오랜 이야기 한 편을 꺼내볼까 한다. 나의 수치와 비겁, 눈물이 범벅 진 순간들을.
E의 본색 : 친절한 미소, 음침한 속내
새 학기, 새 아침이 밝았다. 초등학교생활의 마지막 1년이라는 설렘과 기대감은 ‘E’를 만나면서 산산이 부서졌다. 학기 초에는 보통 가나다라 순으로 자리가 배정된다. 나는 E와 가까운 자음의 성 씨라는 이유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때부터 교묘한 괴롭힘이 시작됐다. E는 깡마른 체구에 얇은 목소리를 가진 여자애였고, 속칭 ‘노는 무리’들과 어울려지냈다. 같은 반이라고 해도 나와 접점이 없었던 터라 엮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제발 E가 나에게 무관심하길 빌었다. 등교할 때마다 날 바라보는 E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째서 늘 불길한 예감은 완벽하게 들어맞는지, E는 내 간절한 바람을 깨고 쉼 없이 말을 걸어왔다. “이름이 뭐야?”, “어디서 살아?”, “형제는 몇이야?” 나는 E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묻는 말에 대답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꺼림칙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다. ‘이만하면 그만하겠지?’ 하는 속마음을 들키기라도 한 것일까? 상상도 못한 E의 돌직구가 날아들었다. “부모님은 뭐 하셔?” 나는 잠시 우물쭈물 대다 “일하셔.”라고 답했다. E는 “아, 그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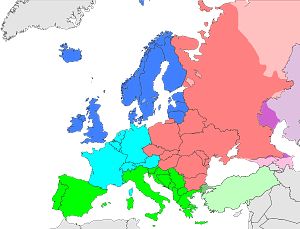



@콩사탕나무 이 글을 쓰면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저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흘러가는 대로 두었다면,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는 사뭇 다른 사람이었을 거예요. 막상 쓰다 보니 피해 경험 보다 가해 경험이 더 짙게 남아 있어서 의외라고 느꼈어요. 또 한편으로는 글을 쓰면서 한 사람이 저지른 폭력은 오롯이 개인의 몫인지, 부조리를 방치한 사회의 몫인지, 둘 다 문제라면 어느 쪽이 비중이 더 큰 지 자문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괴로운 날들을 다시금 꺼내보아야 했기에 마음이 쓰렸지만, 꼭 한 번 쓰고 싶은 글이어서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어요. :-)
조금 희미해졌으면 좋았을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려 쓰시면서 감정적으로 힘드셨을 것 같아요. ㅜ 글을 읽으며 저의 초등학교 시절도 떠오르네요. 비슷하게 크고 작은 상처들, 몇몇 무리의 용인되던 폭력들을 생각하니 오래전이지만 진저리가 쳐집니다.
시간이 흘러도 학교에는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ㅜㅜ
잘 읽었습니다.
@승아의 책장 글구 보면 한국 문단은 개새끼들이에요. 지들이 뭐라고 르포를 마치 듣보잡 취급을 해요. 어느 인간은 르포가 왜 문학 장르에 포함되냐고 되묻는 녀석도 있고... 르포문학은 전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장르이고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제 서서히 르포 문학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악담 님 댓글을 읽고서 생각해 보니 요즘은 한국도 르포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노동자들의 실태를 기록하는 희정 작가 님부터 은유 작가 님, 한승태 작가 님 등 확실히 르포르타주라는 장르가 많이 알려진 듯합니다. 저는 어떤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발로 뛰어야겠어요. 예전부터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터라 아예 이쪽 분야를 파고들어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옛날에는 한겨레에서 르포 문학상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된 것 같기도 하고,,,, 전태일 문학상에서도 르포 분야가 있어요. 뭐, 르포의 핵심은 발로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한승태나.. 아까 소개해주신 작품이 서서히 대우를 받는 것 보며 이제는 한국도 르포에 대한 가치을 인정하는 시대가 온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승아님은 잘 하실 겁니다.
@살구꽃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묶이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학교를 자퇴한 이후로 유독 집단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게 됐어요. 저 또한 얼마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기 검열이 습관화되었습니다. 어릴 때와 같은 잘못을 두 번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부단히 애쓰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을 때면, 종종 환멸감이 몰려 와요…ㅠㅠ
@악담 르포 작가 너무 해보고 싶은 분야입니다.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을 읽고 조지 오웰한테 홀딱 빠진 이후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스타트 끊는 법을 도통 모르겠더군요.ㅠㅠ 일단 좋은 르포 작품을 찾아서 읽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어요.
만약에 르포 작가가 되지 못 하면 인터뷰집이라도 내보고 싶습니다.ㅎㅎ
승아님,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세대를 넘어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어디 학교뿐이겠습니까만은 그 또래 청소년들이 겪는 일상이 정말 실감나네요.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읽으면서 마른침을 삼켰답니다. 글 쓰느라 애쓰셨어요.
승아 님 글을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르포 작가 하시면 훌륭한 작가가 될 거란 생각. 한국에서는 르포가 저평가 되었지만 문학으로써 르포는 세계가 인정하는 장르입니다. 이 장르에서는 한승태 작가가 원탑이지만 승아 님도 도전하시면 한승태 능가하실 수 있음..
@승아의 책장 글구 보면 한국 문단은 개새끼들이에요. 지들이 뭐라고 르포를 마치 듣보잡 취급을 해요. 어느 인간은 르포가 왜 문학 장르에 포함되냐고 되묻는 녀석도 있고... 르포문학은 전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장르이고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제 서서히 르포 문학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콩사탕나무 이 글을 쓰면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저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흘러가는 대로 두었다면,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는 사뭇 다른 사람이었을 거예요. 막상 쓰다 보니 피해 경험 보다 가해 경험이 더 짙게 남아 있어서 의외라고 느꼈어요. 또 한편으로는 글을 쓰면서 한 사람이 저지른 폭력은 오롯이 개인의 몫인지, 부조리를 방치한 사회의 몫인지, 둘 다 문제라면 어느 쪽이 비중이 더 큰 지 자문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괴로운 날들을 다시금 꺼내보아야 했기에 마음이 쓰렸지만, 꼭 한 번 쓰고 싶은 글이어서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어요. :-)
조금 희미해졌으면 좋았을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려 쓰시면서 감정적으로 힘드셨을 것 같아요. ㅜ 글을 읽으며 저의 초등학교 시절도 떠오르네요. 비슷하게 크고 작은 상처들, 몇몇 무리의 용인되던 폭력들을 생각하니 오래전이지만 진저리가 쳐집니다.
시간이 흘러도 학교에는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ㅜㅜ
잘 읽었습니다.
옛날에는 한겨레에서 르포 문학상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된 것 같기도 하고,,,, 전태일 문학상에서도 르포 분야가 있어요. 뭐, 르포의 핵심은 발로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한승태나.. 아까 소개해주신 작품이 서서히 대우를 받는 것 보며 이제는 한국도 르포에 대한 가치을 인정하는 시대가 온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승아님은 잘 하실 겁니다.
@살구꽃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묶이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학교를 자퇴한 이후로 유독 집단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게 됐어요. 저 또한 얼마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기 검열이 습관화되었습니다. 어릴 때와 같은 잘못을 두 번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부단히 애쓰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을 때면, 종종 환멸감이 몰려 와요…ㅠㅠ
승아님,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세대를 넘어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어디 학교뿐이겠습니까만은 그 또래 청소년들이 겪는 일상이 정말 실감나네요.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읽으면서 마른침을 삼켰답니다. 글 쓰느라 애쓰셨어요.
승아 님 글을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르포 작가 하시면 훌륭한 작가가 될 거란 생각. 한국에서는 르포가 저평가 되었지만 문학으로써 르포는 세계가 인정하는 장르입니다. 이 장르에서는 한승태 작가가 원탑이지만 승아 님도 도전하시면 한승태 능가하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