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적응기]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짙어지는 그리움
2024/01/07
“슨생님, 내가 요즘 깜박깜박하고 정신이 더 없어지는 거 같어. 이러다가 정신 놓고 혼자 길거리 돌아 댕길까 겁이 나서 왔다니까.“
혼자 사시는 일흔여덟의 김순이(가명) 할머니의 얼굴에는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나와 할머니밖에 없는 조용한 상담실에 그녀의 한숨 소리가 유독 길고 깊게 들렸다. 검사 전 할머니의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 눈을 맞추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젊은 날의 자신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짙어지는 듯했다.
차분하게 검사를 받으신 할머니의 결과는 다행히 ‘정상’으로 나왔다. ‘정상’이라는 한 마디에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한숨은 안도의 한숨으로 바뀌었다. 이내 소녀 같은 미소를 지으며 기뻐하는 순이 할머니를 보니 덩달아 기뻤다.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도 나고, 부모님도 떠올랐다.
노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루하루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둔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정신조차 희미해지는 것을 자각한다. 사람은 태어나 누구나 늙는다. 생의 주기에 따른 당연한 과정이지만 나는 과연 ‘늙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늙는 것은 아니기에 천천히 나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살피고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르신, 검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또 깜박깜박하고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으면 또 오셔요.”
안 그래도 굽은 허리를 또 굽혀 고맙다고 인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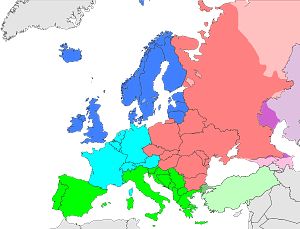



@똑순이
교육 받기 싫어서 직장을 그만둔다! 와하하 진짜 그럴 만도 합니다. ㅎㅎ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시는 똑순이님 존경해요!!!^_^
월요일이네요. 흐흑 ㅜㅜ
안녕히 주무시고 평온한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콩사탕나무 님~ 안녕하세요^^
한주간 고생하셨습니다.
닥치면 한다는 명언을 날리시는 엄마의 말씀처럼 콩사탕님은 잘 하실거라 믿습니다.
교육 받기 싫어서 직장을 그만둔다는 말도 있다고해요.
진짜 제가 다닌 병원도 돌아서면 교육 뒤돌아서면 교육 입니다.
건강 생각하면서 일 하기를 바라요^^
@수지
감사해요!!^^
어르신들 보면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교육이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인지 기능의 차이도 크더라고요. 안타깝고 애틋한 감정들이 일었는데 의외로 '노인이 되어도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느낀 것도 있어요^_^
우아하게 익어가는 수지님의 노년도 응원합니다!!!!
@살구꽃
감사해요^__^
다이내믹한 2024년이네요!!!ㅎㅎ
@50대 가장
아! 정말요?!!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의외로 저 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아이 키우고 다시 일터로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뭔가 의지가 되더라고요^^
따뜻한 응원과 위로 감사해요!!^_^
낼은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니 옷 따숩게 챙겨입으시고, 어머님 케어에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셔요^^
@JACK alooker
현실은 구석에 쭈그러진 아줌마입니다. ㅎㅎ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JACK alooker 님도 감기 조심하시고 가족들과 남은 주말 잘 보내셔용!!!^^
@동보라미
그러게요 ㅋㅋ '닥치면 다 한다'는 말이 무식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진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터에 90년대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쌓은 지혜로 이 상황도 잘 극복하리라 근거없는 자신감을 품어봅니다.^^
낼은 날이 춥대요. 감기 조심하셔요^^
@미혜
혼란의 일주일이었습니다. ㅎㅎ 뭐 닥쳤으니 어찌저찌 되것지요^_^ ;;;;
아이들은 제가 없어서 아직은 좋은가봐요. 해방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괘씸한 것들ㅋㅋ)
감사해요!!!^_^ 미혜님도 화이팅!!!!
@진영 님 감사해요^^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나 손주보다는 그래도 자식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도 아마 똑같은 마음이겠지요?!! 지금껏 가족 안에서 보낸 시간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심어린 응원에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틈 날 때마다 진영님의 맛깔나는 글 읽는 재미가 있어요. ㅋㅋ
남은 주말 잘 보내셔용^_^
@청자몽
지금 제게 모든 것이 혹독하네요. ㅋㅋ 그냥 낯선 환경과 뭔가 동떨어지고 소외되는 듯한 분위기에 무뎌지는 것이 신고식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 표현했어요.^^
제설작업은 진짜 뭐.. 퐝당하더라고요. ;;; 코트입고 갔다가 급 '이게 뭐지?' 했다능요...;;;
그래도 하루하루 발전 중이에요ㅜ 사람 많은 곳은 늘 말이 많고 힘들잖아요. ㅎㅎ
(계약 종료일이 기다려진다는 건 비밀입니다. ㅋㅋㅋㅋ;;;)
새콤이 엄마 상담해주신 선생님은 제가 다 고맙네요. 솔직히 대단한 위로 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한 마디가 '괜찮다'는 말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예비 초등의 입학 준비로 바쁘시죠?!!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잘 누리시길 바라요. 또 언젠가 비상할 @청자몽 님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슈퍼우먼 포스의 @콩사탕나무 님 건강 잘 챙기세요😉
콩사탕나무님~ 새해 첫 출근하자 마자 바로 업무하시느라 아이들 방학이라서 도시락까지 싸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친정 어머니의 ‘닥치면 다 한다’라는 말이 명언이네요! *^^*
잘 하고 계시고 잘 자라고계신 콩사탕나무님을 응원합니다!!!
더욱 더 소중해진 주말 잘 보내세요~ ^^
@콩사탕나무 그래서 바빠 보이셨군요. 아이들이 대견하네요. 콩사탕나무님의 용기도 대단해 보입니당. 누구보다 똑소리나 보이는 콩사탕나무님 금방 적응하시리라 생각해요. 파이팅^^
닥치면 다한다. 명언입니다. ㅎㅎ
엄마들은 훌륭한 내 딸이 집에서 재능 썩하는 걸 젤 안타까워 하시죠.
그리고 요새 애들은 엄마가 일 하는거 좋아합니다. 우리엄만 전업주부란 것보다 엄마 직업이 뭔가를 내세우길 좋아해요.
딱 알맞을 때 잘 나섰습니다. 더 늦으면 점점 힘들죠.
잘 해낼거지만 다시 한 번 화이팅!!
혹독한 신고식;; 이라 그래서 걱정했는데.. 생략;;한건지. 눈 치우기 ㅠ 는 좀 뜬금없네요. 이그..
전에 저 심리상담해주시던 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상한거 전혀 아니고 ㅠ 힘 엄청 드는거 맞다고. 힘내라고 하시면서,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저도 제 자신을 위한 시간 더 많이 가지라고 신신당부했던거도 생각나요.
정신이 진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신 괜찮어.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됐거든요. 순이 할머니도 얼마나 마음이 놓이셨을지..
콩나무쌤이 좋은 일 하는거 맞아요 ㅠ. 아이 두명도 챙기고. 존경합니다. 육아 워킹맘님! 저도 포기 안하고 열심히 잘 살께요. 큰 그림 그리면서. 나의 때도 반드시 오리라 하구요.
잘 자요. 안녕. 좋은 주말 보내구요.
@천세곡
그런가요?! 글이라도 활기가 느껴져 다행입니다!! ㅎㅎ 혼란스러운 일주일이 지나가고 맞이하는 주말 너무 소듕하네요ㅠㅠ
천세곡님도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셔요^_^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시는 것도 힘드실텐데 아이들까지 챙기시려면 정말 정신 없으시겠어요. 그래도 일을 하게 되셔서 그런가 콩나무님의 문장에서 이전보다 더 활기가 느껴집니다. ^^
@똑순이
교육 받기 싫어서 직장을 그만둔다! 와하하 진짜 그럴 만도 합니다. ㅎㅎ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시는 똑순이님 존경해요!!!^_^
월요일이네요. 흐흑 ㅜㅜ
안녕히 주무시고 평온한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콩사탕나무 님~ 안녕하세요^^
한주간 고생하셨습니다.
닥치면 한다는 명언을 날리시는 엄마의 말씀처럼 콩사탕님은 잘 하실거라 믿습니다.
교육 받기 싫어서 직장을 그만둔다는 말도 있다고해요.
진짜 제가 다닌 병원도 돌아서면 교육 뒤돌아서면 교육 입니다.
건강 생각하면서 일 하기를 바라요^^
@수지
감사해요!!^^
어르신들 보면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교육이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인지 기능의 차이도 크더라고요. 안타깝고 애틋한 감정들이 일었는데 의외로 '노인이 되어도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느낀 것도 있어요^_^
우아하게 익어가는 수지님의 노년도 응원합니다!!!!